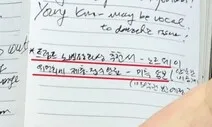역대 정부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거나,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질 때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했다. 역대 정권의 대북 특사는 통상 정보기관 책임자가 맡았지만,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지는 정부 고위 당국자가 특사 임무를 맡은 경우도 여럿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외교안보 특보, 통일부 장관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들이 남북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분단 이후 첫 특사는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다. 사실상 ‘밀사’로서 그는 197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국가주석과 두차례 만났다.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철수, 미-중 관계 완화 등을 추진하자, 박 전 대통령은 이 부장을 북으로 보내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등 3대 통일 원칙이 담긴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5년 10월, 당시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박철언 안기부장 특별보좌관과 함께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남북은 서로 특사를 보내 1·2차 정상회담을 각각 평양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요청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 분산 개최를 요구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강한 의욕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특사인 서동권 안기부장은 1990년 10월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를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 그는 김일성 부자를 동시에 만난 유일한 특사다. 이후 북한은 팀스피릿 훈련을 이유로 이후 남북대화를 거부했다. 김영삼 정부에선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 대표단의 “서울 불바다” 발언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특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 취임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북한에 특사 교환을 제안했다.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특사로 세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2000년 5월 임 원장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했다. 임 원장은 2002년 4월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 자격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 타개책 마련을 위해 서훈 회담 조정관(현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국장(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방북했고,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등의 성과를 냈다. 그가 2003년 1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특사로 다시 파견될 때는 이종석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전 통일부 장관)이 동행했다. 역대 정부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사전에 공개한 것은 임동원 특보의 2002·2003년 방문뿐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2시간30분 동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한 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켰다. 그해 6개국은 북한의 핵무기, 핵계획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가장 최근의 대북 특사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다. 그는 2007년 8월 나흘 간격으로 두차례 방북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메신저’ 역할을 했다. 두달 뒤인 같은 해 10월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2006년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북 특사를 곧 임명할 계획이라고 통일부가 2일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특사가 임명되는 것은 김만복 전 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