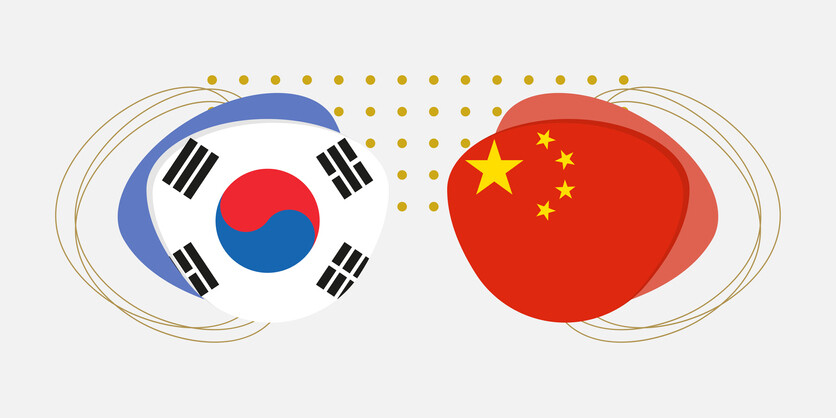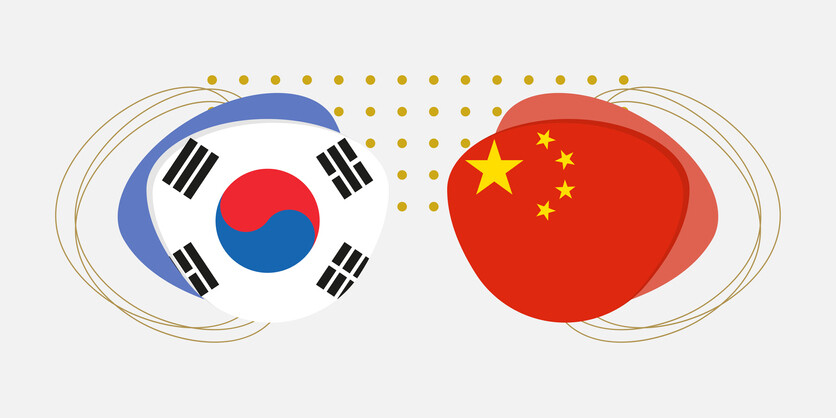한국, 중국, 국기, 한중수교. 게티이미지뱅크
‘달라진 중국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오는 24일로 중국과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경제성장 끝에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른 중국이 공세적 외교·무역정책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관계 설정을 두고 세계 각국의 고민이 깊어간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미주·유럽·중동·아시아 등지 19개국을 상대로 실시해 6월 말 공개한 ‘중국 인식도’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전체 조사 대상국 응답자의 평균 호감도는 27%에 그친 반면, 비호감도는 67%로 나타났다. 낮아진 ‘호감도’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높아진 경계심으로 이어진다. 조사 대상국 평균 응답자의 66%가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다.
외교부와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1992년 수교 직후 한-중 간 무역 총액은 연간 64억달러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수출 1629억달러, 수입 1386억달러 등 교역 규모가 3015억달러까지 높아졌다. 불과 30년도 안 돼 양국 교역량이 47배 이상 늘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국이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1992년 366달러에 그쳤던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 1만500달러까지 28배 이상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8126달러에서 3만1489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다.
30년 전 저개발국이던 중국은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으로 떠올랐다. 중진국이던 한국은 어엿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한-중 수교는 양쪽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줬다. 마늘파동(2000년), 동북공정(2002년) 등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성국이던 두 나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2008년)로까지 나아갔다. 2016년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것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사드 사태 등을 겪으며 양국 감정도 악화했다. 갤럽 조사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7월 59%였지만, 2021년 11월엔 8%까지 떨어졌다. 2018년 12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발표한 각국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한국이 친밀하다고 답한 중국인은 40% 미만(39.5%)이다.
‘의존’은 상호적이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로 대중국 무역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새삼 불거졌다. 서로 1, 2위 교역 상대국인 터라, 뒤집어 보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의존도 역시 만만찮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60%를 중국이 점하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보를 위해 경제를 포기할 수 없듯, 경제를 위해 안보를 희생시킬 순 없다. 그러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안미경중)는 이분법적 도식은 한계에 이르렀다. 중국은 사드를 한국 압박 카드로 쥐고 있고,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을 자국 편에 세우려 하고 있다. 한-중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칩4’로 불리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참여 문제도 사드 문제와 마찬가지로 ‘양자택일’로 여겨선 안 되는 이유다.
수교 이후 중국이 달라진 만큼 한국도 달라졌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요구나 주장은 지난 30년의 호혜적 신뢰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쪽도 이를 잘 알고 있을 터다. 우리는 어떤가?
대선 때부터 ‘가치 외교’ 깃발과 ‘사드 추가 배치’를 내걸며 친미·반중 색채를 강하게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정립된 대중 외교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합적인 상호의존의 세계에서 관계가 악화되면 그로 인한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진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이 또 다른 향후 30년의 한-중 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 너무 쉽게 이념과 가치에 입각해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취할 외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몸무게에 맞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