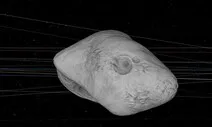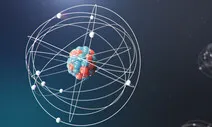마츠 욘손 / 잉에마르 룬드스트룀 / 엘리너 캠벨
전·현직 심사위원 3명 방한…국제교류 강조
“한국의 몇몇 대학을 가봤어요. 어딜 가나 응용연구가 무척 강하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기초’를 하지 않고 ‘응용’을 강조해선 안 됩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벨물리학상 전직 심사위원 마츠 욘손 교수(스웨덴 예테보리대학)와 현직 심사위원 잉에마르 룬드스트룀 교수(스웨덴 린셰핑대학),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스웨덴 왕립한림원 회원인 엘리너 캠벨 교수(영국 에든버러대학) 등 3명은 22일 “젊은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23일 여는 ‘해외 석학 초청 워크숍’에 참석하러 한국에 온 이들 가운데 욘손 교수는 2005년까지 9년 동안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지냈으며, 룬드스트룀 교수는 3년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욘손 교수와 캠벨 교수는 부부 과학자이다.
전·현직 심사위원들은 이날 노벨상 심사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밝혔다. 이들의 말을 들어 보면, 노벨상은 10월에 발표되지만 추천·심사과정은 그해 1월부터 시작한다. 왕립한림원이 정한 각국의 과학자 2천명한테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서는 왕립한림원 정회원 350명,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 7개국의 과학자, 이전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세계 유명 대학들의 교수들한테 보내진다.
“이렇게 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300명을 1~3월에 먼저 추립니다. 위원회가 토론과 심사를 하고 외국에도 평가를 맡기지요. 6~7월이 되면 후보는 더 압축되고, 8월 말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투표로 정합니다. 이게 왕립한림원 물리분과를 거쳐 발표 당일 왕립한림원 차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발표되지요.”
수상자가 바뀌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없는 건 아니다. 1908년엔 양자역학의 기초를 세운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가 막판에 이견이 제기돼 다른 사람으로 바뀐 적도 있다고 한다. 막스 플랑크는 1918년 수상했다.
이들은 한국인의 수상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럽게 평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과학의 역사가 짧아 노벨상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과학자가 얼마나 많이 추천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럴 만한 업적이 나온다면 가능한 일이지요.”
“외국에서 배운 젊은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제 교류도 활발히 할 필요가 있어요. 기초과학을 잘 이루면서 기다리면 노벨상도 올 겁니다.” 욘손 교수는 “여성 수상자가 적다고, 아시아 수상자가 적다고 여성이나 아시아 과학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일은 없다”며 “첫 발견이나 발명을 이루어 새 분야를 개척하거나 인류에 기여한 업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과학자가 압축된 후보군에 든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들은 “심사과정은 50년 동안 말하지 말도록 규정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50년 함구령’은 수상자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엔 결정 과정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심사과정의 심리적 압박을 줄이고자 노벨상위원회가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았다. 글·사진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한국 과학자가 압축된 후보군에 든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들은 “심사과정은 50년 동안 말하지 말도록 규정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50년 함구령’은 수상자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엔 결정 과정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심사과정의 심리적 압박을 줄이고자 노벨상위원회가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았다. 글·사진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