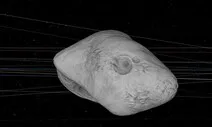유전자를 이용한 민족 기원 연구들을 보면,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엔 이미 정착한 수렵채취 집단들에 견줘 새로 이주한 농경 집단들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부산 가덕도에서 발굴돼 최근 공개된 8000년 전(추정) 신석기 시대의 사람뼈. 사진 한국문물연구원 제공
김욱·김원교수팀 남자 506명 Y염색체 분석
80%서 농경집단 유전형
한국인 특이 유전형 집단1만년 전쯤 옮겨와
80%서 농경집단 유전형
한국인 특이 유전형 집단1만년 전쯤 옮겨와
동북아시아의 현재 민족 집단은 나중에 이주한 원시 농경 집단이 먼저 정착했던 수렵채취 집단을 대체하면서 형성됐음을 확인해주는 유전학과 언어학 연구들이 나왔다. 이는 농업이라는 특정 기술문명이 원시 집단의 팽창과 언어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농경 집단 팽창설을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다.
김욱 단국대 교수와 김원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 남자 506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만 유전되는 와이(Y)염색체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한국인 남자 80%가량에서 농경 집단에 고유한 여러 유전형들이 나타났으며 그중 상당수는 한국인 특이 유전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집단들은 6만~8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온 뒤 동남아와 중국을 거쳐 팽창하며 이주한 농경 집단의 갈래들이다. 논문은 법의학 국제저널 <수사유전학>에 최근 발표됐다.
와이염색체는 부계를 통해 거의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현재 남자의 와이염색체엔 수만년 동안 인류 이동과 민족 분화의 과정에 돌연변이로 생긴 여러 유전형들이 차곡차곡 누적돼 있다. 이 때문에 와이염색체는 인류의 과거를 간직한 ‘유전자 화석’으로 여겨진다. 디엔에이 돌연변이율을 계산하면 특정 유전형이 출현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선 중국 농경 집단 계통(45%)이나 북방 몽골 계통(15%) 이외에 1만년 전쯤 한반도 근처에서 새로운 돌연변이를 얻어 분화한 농경 집단의 유전형(O2b)도 30%가량 발견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여기서 더 분화한 유전형은 일본인한테서도 다수 발견된다. 김욱 교수는 “한국인 특이 유전형의 집단이 1만년 전쯤 팽창해 들어와 한민족의 중심 계통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논문의 제1저자인 김순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 유전자분석실장은 “흔히 신석기·청동기 시대에 우리 민족의 기반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런 학설의 유전학적 근거를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농경 집단과 언어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나왔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영국 <왕립학회보> 최신호에 “현대 일본어의 59개 지방어에서 기본 단어 210개씩을 뽑아 통계기법을 써서 언어 진화의 계통을 분석해보니 일본어는 2200년 전쯤 이주한 농경 집단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논문을 냈다. 연구팀이 지목한 2200년 전은 이미 정착한 수렵채취 집단인 ‘조몬족’에 더해 농경 집단인 ‘야요이족’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하던 때와 겹친다.
제1저자인 션리(인지행동과학 박사과정)는 <한겨레>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언어도 생물처럼 진화한다는 데 착안해 생물 진화 역사를 연구하는 통계기법을 언어에 적용해 분석한 논문”이라며 “이주한 농경 집단이 새로운 영토에서 유전자와 언어를 통해 정복 역사의 흔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민족 기원 연구들이 한·일 두 민족의 현재 관계를 직접 보여주진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션리는 “한국어가 일본어의 뿌리라고 말할 순 없다”며 “두 언어는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공통조상의 언어에서 각각 유래해 다른 진화의 길을 걸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