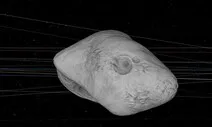구석기 시대의 여러 석기들. 오랜 동안 사용된 쌍날 석기를 만들 때 떼어낸 돌조각들은 버려졌으나(a), 좀더 정교한 혁신 기술인 르발루아 석기를 만들 때 떼어낸 돌조각들은 날카로운 도구로 활용됐다(b, c). 미국 코네티컷대학 등 연구팀 제공
요즘과학
구석기 시대에 석기 제작의 혁신 기술은 한 집단이 아니라 여러 집단에서 따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고고학 유물이 발굴됐다. 그동안 주먹도끼 같은 투박한 석기에서 좀 더 정교한 석기로 이행했던 구석기 시대의 기술 혁신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아시아로 전파됐다고 여겨졌으나, 이번 발견은 이와 달리 독자적 기술 발전의 경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됐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아시아로 나아가는 길목 중 하나였던 아르메니아 중부의 코타이크주 발굴터(‘NG1’)에서 2008년 이래 발굴 작업을 해온 미국 코네티컷대학 고고학자 등 국제연구팀은 최근 이런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지층과 암석의 연대 측정에서 이곳의 유물은 전기 구석기에서 중기 구석기로 나아가던 시기의 초기인 32만5000년 전 무렵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곳에서 나온 수천개의 구석기 유물에서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독특한 석기 기법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몸돌을 쪼아 돌조각(박편)들은 버리고 남은 투박한 도구를 썼던 전통 기법인 ‘쌍날(양면) 석기’ 기술과 더불어 몸돌을 계획된 대로 쪼개어 날카로운 돌조각들까지도 수렵·채취의 도구로 활용했던 ‘르발루아 석기’ 기술이 함께 출토됐다. 고고학에서 르발루아 석기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혁신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연구팀은 이곳에서 발굴된 르발루아 석기가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과는 다르며, 전통과 혁신의 두 기법이 모두 이곳의 원시인류 집단에서 나온 것임을 밝혔다.
이런 발견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먼저, 구석기 기술의 혁신이 아프리카 한곳에서 생겨나 지구촌 전체로 퍼졌다고 보는 기술 진화의 그림이 지금보다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단순한 전파와 확산과는 달리, 일부 지역에선 오랜 동안 전통 기법을 쓰며 개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새로운 석기 기법으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주먹도끼 같은 전통 기법의 석기는 100만년에 걸쳐 사용되다가 20만~30만년 전 무렵에 르발루아 기법이 등장하면서 빠르게 대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32만5000년 전 무렵에 이곳 원시인류가 서로 다른 기법들을 활용할 줄 알았다는 것은 이들이 혁신적이었음을 보여준다”며 “더 많이 이동해야 했던 당시의 수렵·채취 활동에 이런 석기 기술들은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발굴한 석기와 암석을 분석해, 이곳 원시인류가 석기 재료로 쓴 돌을 멀게는 120㎞나 떨어진 화산암 지대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해 이들이 환경과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잘 갖추고 있었다고 풀이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