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 손상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든 정진형(가명)씨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평소엔 활동지원사 3명이 경북 포항의 집으로 방문해 매일 각 8시간씩 하루 24시간 동안 신체·가사 활동, 이동을 도와준다. 오랫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왔기에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꺼렸던 그는 확진 뒤 7일 동안 자가격리됐다. 그 기간 동안 정씨 집에 함께 격리돼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 24시간 온종일 돌봄과 의료대응을 한 건 활동지원사 박아무개(53)씨다.
격리 4일째 되던 날 정씨는 호흡 곤란으로 한밤중 응급실에 실려가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상태가 언제 어떻게 나빠질지도 모르니, 박씨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가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하루 24시간 돌봄 가운데 3~4시간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휴게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던 박씨는 강력하게 항의한 끝에 하루 24시간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고단한 돌봄 대가를 인정해주려 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이용자가 사용하는 전자바우처 근무시간 기록용 단말기. 김 활동가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2020년 2월)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장애 정도에 따라 격리시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가격리를 하되 돌봄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종일 돌봄을 하는 활동지원사들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24시간 근무에서 3~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고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을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왔다.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활동지원기관(민간에 위탁)을 골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활동지원사 김아무개(32)씨도 지난 4월 장애인 확진자 집에서 격리돼 24시간 일하는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휴게시간 의무 사용을 지시받았다. 쉴 때마다 ‘근무시간 기록용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 근무시간을 종료하라는 요구였다. 이렇게 근무시간 기록이 남지 않으면 그만큼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씨는 “잠시 쉬다가도 환자 분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돌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법 규정처럼) 8시간 일하다 (칼같이) 1시간 동안 쉬겠느냐”며 “지방자치단체나 활동지원기관마다 업무 관리 방침이 달라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휴게시간을 쓰라고 강요받는 등 혼란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에 올라온 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활동지원사에게 정부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동안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급여가 책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돌봄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긴 어렵다. 권동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휴게시간은 일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고, 대기 시간이 아니어야 하는데, (24시간 활동지원사) 분들은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지만,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긴급돌봄 취지상 활동지원사가 24시간 근무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 영역이라 (활동지원기관 등에) 따로 안내 지침을 내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미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정부가 현장 혼란을 없앨 실효성 있는 지침을 주어야 한다”며 “7일 간 공동격리 상황에서의 활동지원을 정부가 24시간 근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무 종료·시작을 기록하는 등 번거롭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정해진 급여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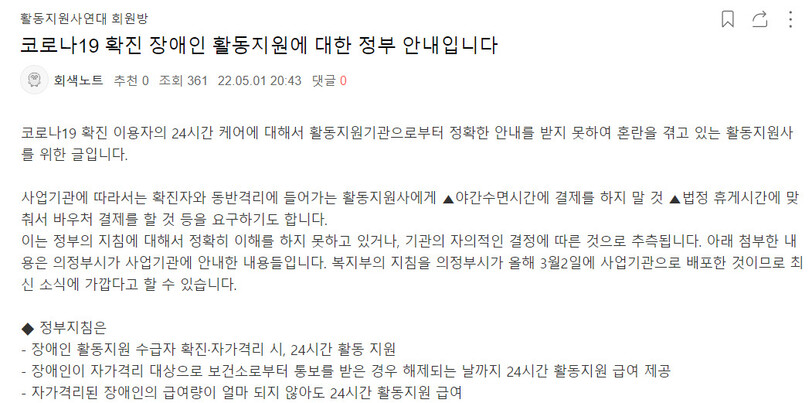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