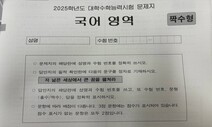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대형마트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와 작업환경 개선을 대형마트 업계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함금남(55)씨는 날마다 자신의 키 높이만큼 쌓인 제품 상자들과 씨름한다. 상자들을 매장에 옮기고 진열한 뒤 남은 상자는 키보다 훌쩍 높은 선반 꼭대기에 올려놓아야 한다. 통조림이나 병제품 등 무거운 제품들은 20㎏에 이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가 옮겨야 하는 상자는 더 늘었다. 마트 경력 17년차인 함씨는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을 달고 산다. 함씨는 28일 “거의 모든 동료들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매일 약을 먹고, 쉬는 날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며 “상자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만 만들어도 아픈 사람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언제쯤 바람을 들어줄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명절 상품들이 마트마다 상자째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마트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들이 상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도 노동자가 무거운 짐을 들어올려야 하는 경우 사업주가 경감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마트 노동자 5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년 사이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69.3%(3586명)에 이르렀다. 85.3%(4037명)는 상품 진열 작업 때문에 신체 통증을 호소했다.
이날 <한겨레>가 취재에 응한 5명의 마트 노동자들도 모두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통제 등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산재성 질환이지만 치료비 지원은 ‘언감생심’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안아무개(50)씨는 2018년 3월께 마트에서 근무한 지 17년 만에 병원에서 어깨 부위 ‘석회성 건염’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지만 마트 쪽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술과 치료를 단념하고 진통제와 소염제로 버티고 있다는 안씨는 “통증이 심해 수시로 옮기던 상자를 떨어뜨려 발등을 찍기도 하지만 역시 모든 치료비는 자비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주인 대형마트들이 상자 손잡이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자 손잡이 설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 마트 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의 책임은 대형마트 쪽에 있으니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나서라”고 요구했다. 마트 노동자 김선경(43)씨는 “손잡이가 없는 상자는 밑동을 받쳐 들어야 해서 무게가 팔과 어깨 상체로 다 오지만 손잡이가 있으면 하체를 이용해 간단하게 들 수 있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상자 손잡이 설치는 간단하지만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꼽힌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트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율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연구를 보면 상자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공학적으로 노동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