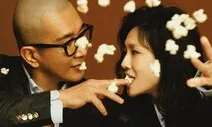[가신이의 발자취] 고 이동진 선생 기리는 친구의 글

1980년대 중반부터 부부 교사로 ‘전교조’ 참교육운동에 앞장섰던 고 이동진(왼쪽)씨와 부인 표외숙씨가 고향인 전북 남원이 내려다보이는 지리산 정령치에서 함께한 모습이다. 사진 김민곤씨 제공
1985년부터 ‘교육민주화운동’ 두차례 옥고
2015년까지 국제교원노조운동 앞장
낙향해 자연농업연구 5년만에 사고사 모내기할 논을 오가는 트랙터가 이젠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요즘이다. 동진아, 네가 2020년 12월 6일 트랙터 사고로 졸지에 우리 곁을 떠나고 벌써 다섯 번 철이 바뀌었다. 너무 황망해서 격식 갖춘 영결식도 챙기지 못해 내내 켕겼다. 지금도 느닷없이 너한테 전화가 올 것 같다. “어디 있냐? 나 서울 가는 중인데 얼굴 좀 보자!” 우리가 만난 지 꼭 반세기가 됐구나. 며칠 전 불어과 동기들이 50년 전을 회고하는 자리가 있었다. 1972년 유신독재에 맞섰던 스무 살 청년들이 일흔 고개를 넘고 있다. 벌써 빈자리가 둘이다. 대학은 수시로 휴교로 문을 닫고 사는 것이 팍팍하던 1974년 4월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너는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 그렇게 학교에서도 쫓겨나 구로동에서 야학도 하고 난방기술 자격증도 따서 '보일러 학원’ 강사 활동도 하면서 6년이나 학교 밖에서 버텨내야 했다. 1980년 초 ‘서울의 봄’ 복학생이 된 네가 사립학교 프랑스어 초임교사로 일하던 나를 찾아와 우리는 재회했지. 그 간 살아온 역정을 들려주면서 네가 쓴 프랑스어 단어 ‘쇼디에르’(보일러)를 기억하고 있어. 그때 네 권유로 1980년 교육민주화운동 초석 노릇을 한 서울와이엠이에이(YMCA) 중등교사회에 참여하게 됐으니 우리 인연은 남다른 데가 있어. 너는 1985년 3월 비로소 교직에 들어와 그 때부터 우리는 교사운동 대열에 늘 함께한 동지가 되었지.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서울 강남동지회장을 맡은 너는 그해 여름 또 구속됐고 말았어. 나는 ‘ 빵 복’ 많은 너를 좀 부러워하기도 했단다. 100명 넘는 교사를 구속하고 1500명이 넘는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는 국가폭력이 자행된 때였어. 그해 늦가을 너의 석방 환영회 자리에서 ‘빵잽이 부담감을 벗게 됐다!’ 고 했을 때 환호작약하던 네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엊그제가 전교조 33돌 기념일이었네. ‘내 벗 이동진은 재야운동 진영에 발이 넓어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할 때 연대사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1991년 ‘고 강경대 열사 폭력 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또 구속되어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세 번째 수난이었다.

교육인터내셔널(EI) 본부는 2020년 12월 6일 고 이동진 중앙집행위원이 별세하자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EI 누리집 갈무리

고 이동진씨가 일궈놓은 전북 남원의 한결농장에서 지난 3월 중순 씨감자를 심고 있다. 사진 김민곤씨 제공

지난 봄 심었던 감자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전북 남원 한결농장의 5월 전경. 사진 김민곤씨 제공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겨레>가 어언 35살 청년기를 맞았습니다. 1988년 5월15일 창간에 힘과 뜻을 모아주었던 주주와 독자들도 세월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새로 맺는 인연보다 떠나보내는 이들이 늘어나는 시절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탓에 이별의 의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는 떠나는 이들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이자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물론 가족, 친척, 지인, 이웃 누구에게나 추모의 글을 띄울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주주통신원(mkyoung60@hanmail.net), 인물팀(People@hani.co.kr).
<한겨레>가 어언 35살 청년기를 맞았습니다. 1988년 5월15일 창간에 힘과 뜻을 모아주었던 주주와 독자들도 세월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새로 맺는 인연보다 떠나보내는 이들이 늘어나는 시절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탓에 이별의 의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는 떠나는 이들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이자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물론 가족, 친척, 지인, 이웃 누구에게나 추모의 글을 띄울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주주통신원(mkyoung60@hanmail.net), 인물팀(Peop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속보]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 [속보]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3524.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