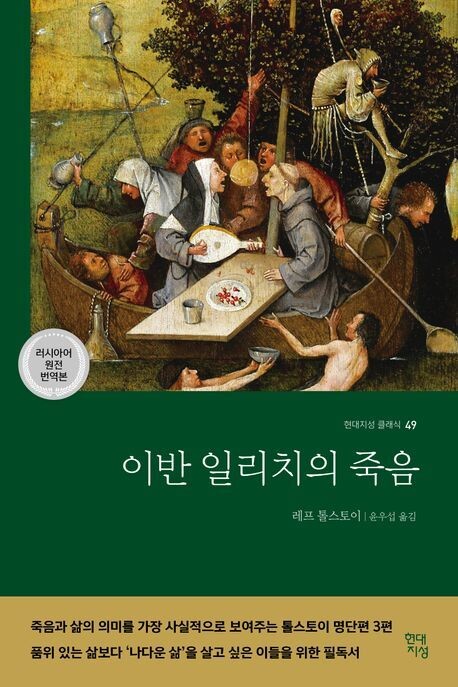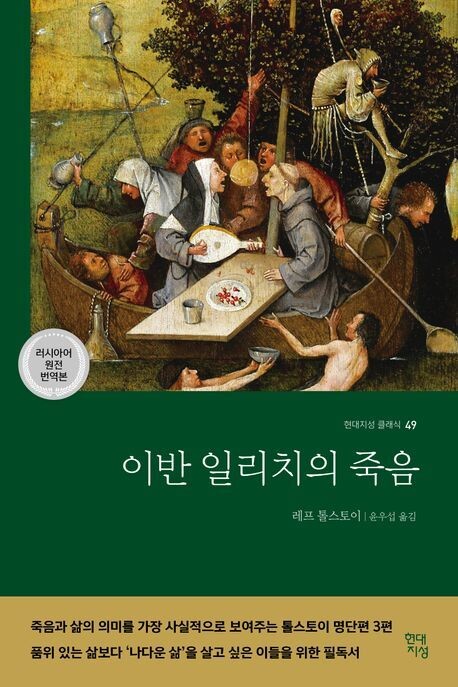레프 톨스토이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안나 카레니나’를 떠올린다. 이 작품은 톨스토이를 대표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소설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안나 카레니나’는 번역본이 1500쪽을 넘어가는 대작이니 막상 읽자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톨스토이를 읽어 보겠다는 사람에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권한다. 100쪽을 겨우 넘는 중편소설이지만 1000쪽이 넘는 대작이 주는 감동과 공감에 전혀 뒤지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다 보면 이렇게 짧으면서도 이렇게 재미나고 깊이 있는 소설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룬 저작 중에서 가장 윗길에 속한다. 죽음을 둘러싼 인간의 심리 묘사를 이토록 정확하고 세밀하게 묘사한 소설은 매우 드물다. 지겹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소설도 아니다. 죽음을 다루는 소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판사로 일했던 이반 일리치의 부고 소식이 그가 일했던 직장에 전해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직장 동료의 죽음을 접하고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생기는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대한 기대를 먼저 생각한다. 또 가까운 사람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 사람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죽은 사람은 자신이 아닌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일종의 기쁨을 느낀다. 말하자면 죽음이란 타인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일 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의라는 이름의 귀찮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반면 죽어가는 이반 일리치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라는 1969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발표한 죽음 수용의 5단계를 고스란히 거친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1886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톨스토이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이반 일리치는 가족마저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는 공연을 보러 다니는 등 자신들의 일상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꺼이꺼이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한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감으로 결속될 수 있다.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국 결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톨스토이는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부정할 때 결국 인간 각자는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의 고통보다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다.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라는 것일까? 이 말은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공감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간다면 분명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균호 교사, ‘나의 첫 고전 읽기’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