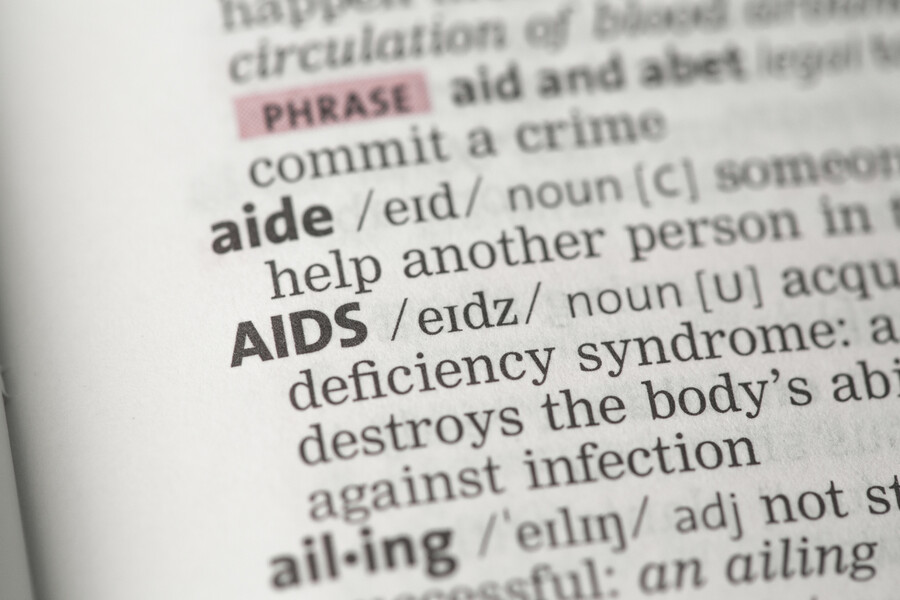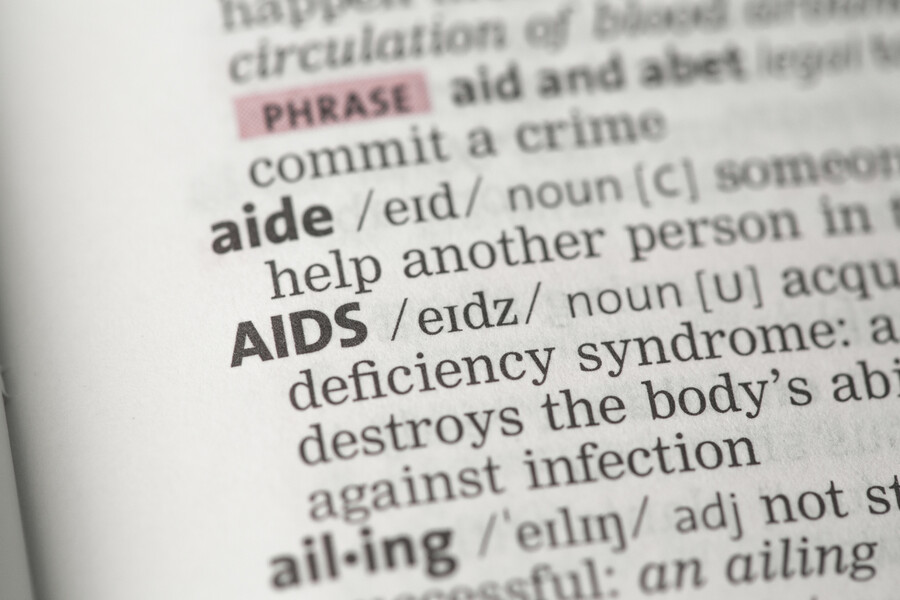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된 ‘외국인 영어강사 체류연장 비자발급시 에이즈(AIDS) 감염 확인 검사 강제지침’을 거부해 국내에서 사실상 추방된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재판장 이창열) 미국인 영어강사 벤저민(가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벤저민은 2006년 ‘회화지도’(E-2)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2009년까지 경기도 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당시 법무부는 회화지도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할 때, 범죄경력증명서와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2009년 2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벤저민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건강진단서 제출을 거부했고, 결국 2009년 7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벤저민은 외국인에게만 에이즈 검사를 강요하는 출입국 관련 규정을 다투기 시작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2011년 9월 헌재는 그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판단은 달랐다. 헌법소원 각하 뒤 벤저민은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구제를 신정했는데, 자유권규약위는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자유권규약위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당사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우리 국회는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 동의했다.
이를 토대로 벤저민은 한국 정부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출입국 관리와 관련한 법령은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유권규약위 견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어 건강진단서 관련 규정이 2017년 삭제됐지만, 벤저민에게 소급 적용할 수도 없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같은 쟁점을 다툰 사건에서 정반대의 판결도 있다.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벤저민과 같은 규정을 문제 삼은 뉴질랜드 국적 엠마(가명)에게 정부가 3천만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강진단서 강요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법상 자유권규약 등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당사자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외국인이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규정을 만들었고, 사법부도 이를 비판없이 받아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자유권규약 등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국제인권조약이 판결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법률가가 되는 과정에 국제법을 제대로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국제법 흐름을 따라야 마땅하지만 현재로썬 개별 재판부의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