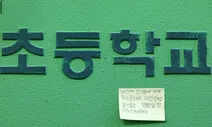국정원 감시 타깃으로 드러난 국내 SKT 사용자
① 국내 통신망 사용자 해킹 ○
② 내국인 사찰 △
③ 해킹 논란, 정보전 능력에 악영향 △
④ 북한도 RCS 사용했다 ×
⑤ 우리만 호들갑 ×
② 내국인 사찰 △
③ 해킹 논란, 정보전 능력에 악영향 △
④ 북한도 RCS 사용했다 ×
⑤ 우리만 호들갑 ×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RCS) 도입·운영 사건이 드러난 지 2주일 가량이 흐르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민들을 사찰했느냐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2.9%가 ‘내국인 사찰을 했을 것’이라고 답할 만큼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 <한겨레>는 이 가운데 핵심적인 질문을 뽑아 그동안 확인된 사실을 정리했다.
해킹 대상에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나?
이탈리안 보안업체인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6월3일, 4일, 17일 세차례에 걸쳐 국내 이동통신사인 에스케이텔레콤(SKT) 사용자를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일 사용자의 기기는 갤럭시 노트2로 한국어 설정을 해두고 있었다. 요컨대, 국내에 있고 한국어 설정의 한국 스마트폰을 쓰는 이가 해킹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관의 생리상 민간인 사찰을 안하고 배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국정원과 해킹팀 사이에 거래를 중개했던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숨진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가) 중국에 있는 내국인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한겨레> 보도 뒤에 “중국에 있는 중국인을 착오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북한과 남한을 오간 조선족을 허 대표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만 호들갑이다?
유럽의 섬나라 키프로스의 정보기관 수장은 이번 유출 자료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14일 사임했다. 회원국인 이탈리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수의 국가들에 팔았다는 사실에 유럽연합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이런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질의를 한 상태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국민 몰래 감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논란이다. 정보인권단체 ‘프라이버시인터네셔널’은 “해킹팀 유출은 이쪽 업계의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이번에 유출된 전례없는 분량의 400기가(GB)의 방대한 자료는 정보기관과 해킹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하는지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킹 논란은 우리나라 정보전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
여당은 야당의 진실 규명 요구가 국정원의 첩보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2일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정원이 어떤 공작 활동을 했는지는 100% 국가기밀”이라며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는) 폭거”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해킹팀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해 국정원에 30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명확한 진실 규명이 국민의 정보주권 보호뿐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전 능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22일 “제가 이 일을 맡은 것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트위트했다.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갈수록 거세지는 각국 정부의 정보전 군비 경쟁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다.
북한도 해킹팀 프로그램 썼다?
유출된 해킹팀 내부 전자우편을 보면 북한이 언급되는 경우는 모두 보안업계 정보지나, 외신 보도 등으로 국한된다. 이를 바탕으로 잡담을 나누거나 막연한 사업기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다. 금융 거래나 사업 계획 등과 관련된 파일에서 북한이 등장하는 경우는 아직 어디서도 확인된 바 없다.
외국인은 해킹해도 상관 없나?
아르시에스 도입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활동도 아니었고 대상도 외국인이었으니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태도다. 하지만 국정원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의 해킹 시도는 상대국이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외교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해킹 대상이 상대국 국적자라면 문제는 한층 심각해질 수 있다. 외교 문제를 떠나 국내법을 적용받는 국정원이 해킹을 했다면 그 대상의 국적이나 소재지와 무관하게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해킹은 어떤 경우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권오성 김외현 기자 sage5th@hani.co.kr
관련영상:거짓말이야, 감추자[불타는감자 #19]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