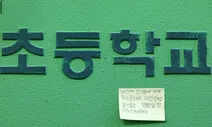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결과
실제로는 10명 중 5명 계층상승
선진국은 실제와 비슷하게 인식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 크기 때문”
실제로는 10명 중 5명 계층상승
선진국은 실제와 비슷하게 인식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 크기 때문”
한국인 자녀세대 10명 중 5명은 아버지의 직업계층보다 상승했지만, 이를 인식하는 한국인은 10명 중 3.8명에 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우리사회의 계층구조 고착화 경향 탓에 계층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탓으로 풀이됐다.
5일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백승호(가톨릭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사회이동 수준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함의’를 보면, 한국은 전체 자녀세대 가운데 절반인 50% 정도가 아버지 세대보다 직업계층이 상승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7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핀란드 45.4%, 덴마크 44.6%, 프랑스 44.9%, 미국 41.7%, 독일 38.8%, 일본 26.1%로 집계됐다.
하지만 “본인의 직업계층이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비해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매우 높다”와 “높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전체의 37.7%로, 10명 중 약 3.8명에 불과했다. 아버지보다 상승 이동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프랑스가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핀란드 48.2%, 덴마크 46.8%, 미국 45.8%, 독일 39.9%, 일본 22.2% 순이었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층상승을 했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실제 상승한 비율보다 약간 더 높거나 비슷했지만, 한국에선 실제보다 인식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극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산업화 과정에서 높은 사회이동을 겪어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한국인들이 오늘날 계층구조 고착화 경향과 부딪히면서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연구팀은 직업계층을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일반숙련직, 저숙련직’ 등 5개 직군으로 분류하고 국제사회조사(ISSP)의 지난 2009년도 사회 불평등 자료를 바탕으로 7개 나라 계층이동을 분석했다. 정해식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최근 사회조사에서도 계층이동(상승)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경고음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함께 결과의 불평등을 수정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