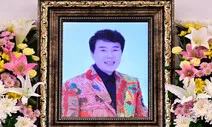“함께 탄압받았던 동료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을 보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저도 2012년에 청구했죠. 1심에서는 인정됐는데 2심은 재판을 3년이나 끌더니 각하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과거사 손해배상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라서 뭘 해도 안 되겠구나 싶어 상고도 포기했습니다.”
이아무개(60)씨는 지난달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1980년 3월 회사 동료들과 ‘남화전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그해 ‘노조 정화조치’라는 이름 아래 노조를 와해시키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까지 방해했다.
이씨도 ‘정화조치’ 대상이었다. 직장을 잃은 이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새 직장에서도 번번이 해고됐다. 이씨의 억울함은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위)의 보상과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으로 뒤늦게 풀리는 듯했다. 이를 근거로 이씨는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법원도 이씨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노조를 와해시켰으며 블랙리스트를 관리·유통시켜 취업을 방해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10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낸 소송이 장기간 2심 법정에 묶여있던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자기 “(민주화보상위의)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사람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이미 정부 보상금을 받았다면 더 이상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그해 12월 이씨의 2심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은 3년여 만에 바뀌었다. 지난 5월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작성된 문건에서 대법원의 민주화보상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협력 사례”로 꼽힌 사실이 드러났다. 석 달 뒤인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을 되돌려 놓는 결정을 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며 관련 법 조항에 일부 위헌 결정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던 이씨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헌재에 자신의 권리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만 헌재 결정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이씨도 실낱같지만 구제 받을 방법은 있다. 앞서 이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소송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각하 판결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씨가 지난달 다시한번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문제다.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내야 한다. 이씨가 첫 소송을 제기할 때(2012년 7월25일)를 기준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 반면 헌재 결정일(2018년 8월30일)이 기준이 되면 손배해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12일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이씨의 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