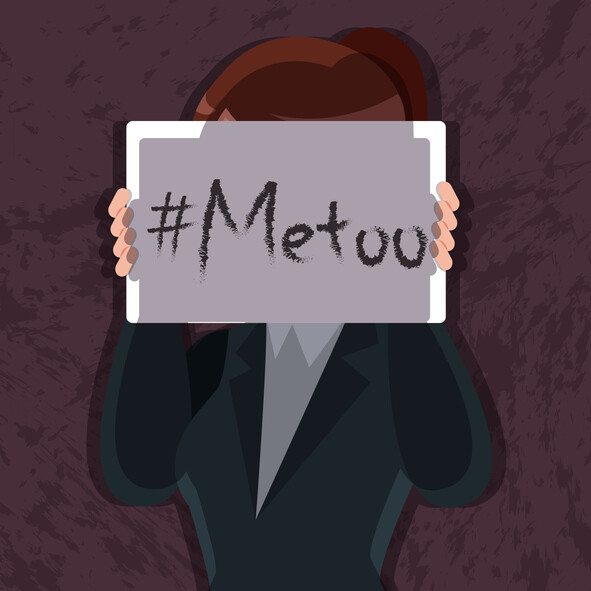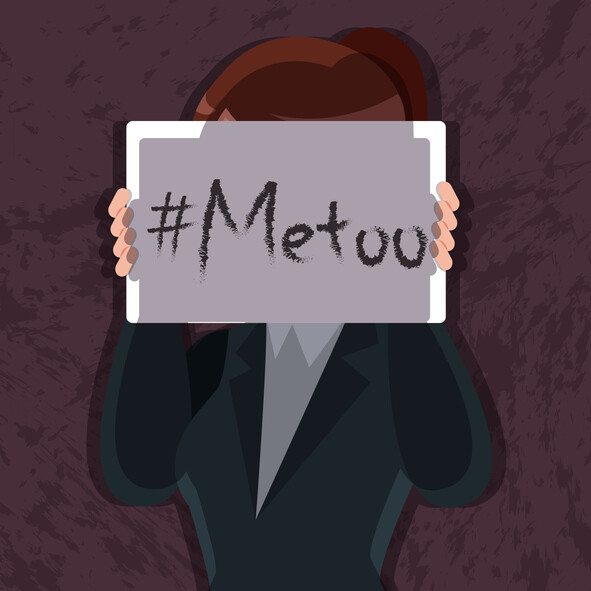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더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과도 맞서야 한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쪽에선 종종 피해자의 완벽에 가까운 순수함과 도덕성을 요구하며, 일부 언론 보도는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희생양’으로서 피해자의 약한 모습만을 다룬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다움’을 더 철저히 검증받는다. 2014년 한 국가기관 내부에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두고 내부 관계자들은 “그 친구가 그렇게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다”, “다른 조직으로 옮기고 싶어서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며 가해자를 옹호했다. 나중에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도 비슷하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고발한 김지은씨는 저서 <김지은입니다>에서 ‘안희정의 가족들이 나에 대한 정보 ‘취합’을 위해 과거 연애사와 평소 행실을 수집했다. 안희정의 주변 사람들이 준비하기 시작한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이상하고 문제 있는 여자로 만들어졌다’고 돌아봤다. 안 전 지사 쪽의 전략대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피해자다움’에 집중했다.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물색하려고 애쓴 점’ 등을 들어 김씨에 대해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근 박 전 시장의 주변에서도 피해자 고백의 ‘진의’를 의심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권력관계를 의식해 사건 직후 피해를 알리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은 되레 가해자의 변명에 이용되기도 한다. 안 전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지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는 ‘성폭행 피해자라면 보이지 않았을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보면, 직원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업주가 “(신체접촉 직후) 사과했더니 피해자도 괜찮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오히려 내 옆에서 애교를 부리고는 했다”며 피해 진정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 돼요, 싫어요”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라면 응당 ‘거센 저항’에 나서야 한다는 선입견도 피해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실상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으로 인해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선 응답자 1만106명 중 13.5%가량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당시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44.0%) △성폭력인지 몰라서(23.9%)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8.5%) △공포심에 몸이 굳어서(11.1%)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대응이 되레 피해 호소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대학생 ㅁ씨는 동아리 회장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뒤 자신의 숨소리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로 후유증을 앓았지만 ‘가해자보다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에 담담한 척 학교생활을 이어갔다. 이는 가해자가 이후 학교 차원의 성폭력 해결 과정에서 ㅁ씨의 ‘피해자다움’을 지적하는 빌미가 됐다. 사회운동단체 선배에게 강간을 당할 뻔한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가방을 뒤적이는 등 “너무 태연한 모습”이 담겼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이 가해자의 편에 선 사례도 있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