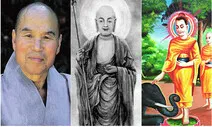선시종가 1080
8. 과거시험장이 아니라 선불장 ( 選佛場 ) 으로 발길을 돌리다
 ( 본문 )
시방동일회 ( 十方同一會 ) 각각학무위 ( 各各學無爲 )
차시선불처 ( 此是選佛處 ) 심공급제귀 ( 心空及第歸 )
사방팔방에서 다함께 모여 각각 무위법을 배우네 .
여기는 부처를 뽑는 곳 마음을 비워 급제해서 돌아가네 .
흔히 방거사 ( 龐居士 ) 라고 불리는 방온 ( 龐蘊 ?~808) 이 남긴 심공급제게 ( 心空及第偈 ) 이다 . 여기에 ‘ 급제 ’ 라는 말이 나온다 . 깨닫는 것은 ‘ 급제 ’ 라고 했으니 깨닫지 못한 것은 ‘‘ 낙제 ’ 가 되겠다 . 급제라는 말을 통해 그의 행적이 과거시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 그는 젊은 시절 단하천연 선사와 더불어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다 . 과거장으로 가던 도중 머물던 여관에서 어떤 객승을 만났다 . “ 과거장이 아니라 선불장으로 가는게 어떠냐 ?” 는 말 한 마디에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려 마조도일 (709~788) 선사를 찾아 갔다 . 질문과 대답 끝에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게송을 짓게 된다 . 하지만 그는 출가하지 않았고 가족과 함께 수행하는 재가거사의 표상으로 남았다 .
선불처 ( 選佛處 ) 는 마조스님 문하 ( 門下 ) 를 의미하는 선불장 ( 選佛場 ) 을 말한다 . 선원을 개설한 이유는 선량 ( 選良 ) 이 아니라 선불 ( 選佛 ) 을 위함이다 . ‘ 과거장 ( 科擧場 관리를 선발하는 곳 )’ 이라는 의미를 빌려와서 ‘ 선불장 ( 選佛場 부처를 뽑는 곳 )’ 으로 바꾸었다 . 우리나라에도 ‘ 승가고시 ’ 흔적이 지명으로 남아있다 . 서울 강남 봉은사 앞 무역회관 자리가 ‘ 승과평 ( 僧科坪 )’ 이다 . 같은 이름이 광릉 봉선사에도 있다 . 당나라 ‘ 선불장 ’ 을 조선식으로 바꾼다면 ‘ 승과평 ’ 이 될 것이다 . 그리고 현재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에 붙어있는 ‘ 선불장 ’ 현판은 이러한 당나라와 조선의 과거 ( 科擧 )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
( 해설 )
과거시험에 몇 번 씩 떨어진 당사자의 심경은 어떨까 ? 당나라 장계 ( 張繼 생몰연대 미상 ) 는 낙방 후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리 아래 세워 둔 배에서 하룻밤을 묶었다 . 이미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고 있는 서리가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잠까지 설쳤다 . 한밤중에 한산사 ( 寒山寺 ) 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다가 그 처연한 심정을 ‘ 풍교야박 ( 楓橋夜泊 )’ 이란 절창 ( 絶唱 ) 으로 남겼다 . 낙방의 심경을 노래한 것이지만 그 공감력으로 인하여 대대로 전해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 급제했던 수많은 관료들의 명함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낙방한 그의 이름은 오늘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
( 본문 )
시방동일회 ( 十方同一會 ) 각각학무위 ( 各各學無爲 )
차시선불처 ( 此是選佛處 ) 심공급제귀 ( 心空及第歸 )
사방팔방에서 다함께 모여 각각 무위법을 배우네 .
여기는 부처를 뽑는 곳 마음을 비워 급제해서 돌아가네 .
흔히 방거사 ( 龐居士 ) 라고 불리는 방온 ( 龐蘊 ?~808) 이 남긴 심공급제게 ( 心空及第偈 ) 이다 . 여기에 ‘ 급제 ’ 라는 말이 나온다 . 깨닫는 것은 ‘ 급제 ’ 라고 했으니 깨닫지 못한 것은 ‘‘ 낙제 ’ 가 되겠다 . 급제라는 말을 통해 그의 행적이 과거시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 그는 젊은 시절 단하천연 선사와 더불어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다 . 과거장으로 가던 도중 머물던 여관에서 어떤 객승을 만났다 . “ 과거장이 아니라 선불장으로 가는게 어떠냐 ?” 는 말 한 마디에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려 마조도일 (709~788) 선사를 찾아 갔다 . 질문과 대답 끝에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게송을 짓게 된다 . 하지만 그는 출가하지 않았고 가족과 함께 수행하는 재가거사의 표상으로 남았다 .
선불처 ( 選佛處 ) 는 마조스님 문하 ( 門下 ) 를 의미하는 선불장 ( 選佛場 ) 을 말한다 . 선원을 개설한 이유는 선량 ( 選良 ) 이 아니라 선불 ( 選佛 ) 을 위함이다 . ‘ 과거장 ( 科擧場 관리를 선발하는 곳 )’ 이라는 의미를 빌려와서 ‘ 선불장 ( 選佛場 부처를 뽑는 곳 )’ 으로 바꾸었다 . 우리나라에도 ‘ 승가고시 ’ 흔적이 지명으로 남아있다 . 서울 강남 봉은사 앞 무역회관 자리가 ‘ 승과평 ( 僧科坪 )’ 이다 . 같은 이름이 광릉 봉선사에도 있다 . 당나라 ‘ 선불장 ’ 을 조선식으로 바꾼다면 ‘ 승과평 ’ 이 될 것이다 . 그리고 현재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에 붙어있는 ‘ 선불장 ’ 현판은 이러한 당나라와 조선의 과거 ( 科擧 )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
( 해설 )
과거시험에 몇 번 씩 떨어진 당사자의 심경은 어떨까 ? 당나라 장계 ( 張繼 생몰연대 미상 ) 는 낙방 후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리 아래 세워 둔 배에서 하룻밤을 묶었다 . 이미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고 있는 서리가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잠까지 설쳤다 . 한밤중에 한산사 ( 寒山寺 ) 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다가 그 처연한 심정을 ‘ 풍교야박 ( 楓橋夜泊 )’ 이란 절창 ( 絶唱 ) 으로 남겼다 . 낙방의 심경을 노래한 것이지만 그 공감력으로 인하여 대대로 전해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 급제했던 수많은 관료들의 명함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낙방한 그의 이름은 오늘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
 홀홀단신이라면 낙방해도 툴툴 털고 다음을 기약하면 되겠지만 식솔이 딸린 가장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 아무리 가족은 내 편이라고 하지만 ‘ 낙방 ’ 은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 당나라 중엽 조씨 ( 趙氏 ) 부인이 지은 ‘ 부하제 ( 夫下第 남편의 낙방 )’ 에 관한 시는 이런 복잡미묘한 심경을 잘 보여준다 . 해마다 낙방이라는 고배를 마시니 가족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동네사람 보기에도 민망했다 . 깜깜하여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때 집으로 들어 오라고 부탁아닌 부탁을 해야했다 . 낙방생을 맞이하는 부인의 안타까움과 원망이 동시에 묻어난다 .
낭군께서 분명 남다른 재능있는데 ( 양인적적유기재 良人的的有奇才 )
어찌하여 해마다 그냥 돌아오시나요 .( 하사연년피방회 何事年年被放回 )
이젠 저도 그대 뵙기 민망하오니 ( 여금첩면수군면 如今妾面羞君面 )
오시려거든 날 어둑해지면 그 때 돌아오세요 .( 군약래시근야래 君若來時近夜來 )
제 3 자인 가족이 아니라 시험당사자였던 당청신 ( 唐靑臣 ) 은 대놓고 스스로 ‘ 낙제시 ( 落第詩 )’ 를 썼다 . 그 역시 낙방 후 고향으로 바로 오지 못하고 장계 ( 張繼 ) 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거의 거지몰골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 가족들은 아무리 표정을 감추고서 반갑게 맞이하려고 해도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 그건 부인이건 자식이건 모두 마찬가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무조건 반겨주는 녀석이 있다 . 마당에 있는 누렁이다 . 예나 지금이나 이 맛에 반려견을 키우는 모양이다 . 충견에게는 낙방해도 내 주인이고 급제해도 내 주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이다 .
급제하지 못하고 먼길을 돌아오니 ( 부제원귀래 不第遠歸來 )
처자의 낮빛이 반기는 기색없네 .( 처자색불희 妻子色不喜 )
누렁이만 흡사 반갑다는 듯 ( 황견흡유정 黃犬恰有情 )
문 앞에 드러누운 채 꼬리를 흔드네 .( 당문와요미 當門臥搖尾 )
방거사를 비롯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장을 포기하고 선불장으로 간 것은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당시 과거제도의 문란도 한 몫했다 . 실력있는 수험자는 차고 넘치는데 소수의 합격자는 이미 따로 내정되었다 . 모르긴 해도 방거사와 수재 ( 秀才 단하천연 본명 ) 거사도 실력과 상관없이 몇 번씩 낙방이라는 고배를 마셨을 것이다 . ( 물론 자랑할만한 일은 아닌지라 그런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 그래서 ‘ 과거장이 아니라 선불장으로 !’ 란 말 한 마디에 바로 필이 꽂힐 수 있었던 것이다 . 이후 마조대사 문하의 기라성같은 선불 ( 選佛 ) 들은 당나라 사상계와 종교계의 주류로 등장하게 된다 . 어쨋거나 과거장 출신들은 과거장 출신답게 주어진 몫을 다하고 선불장 출신들은 선불장 출신답게 자기본분을 다하면 될 일이다 .
글 원철 스님 / 불교사회연구소장 .
*** 이 시리즈는 대우재단 대우꿈동산과 함께 합니다 .
홀홀단신이라면 낙방해도 툴툴 털고 다음을 기약하면 되겠지만 식솔이 딸린 가장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 아무리 가족은 내 편이라고 하지만 ‘ 낙방 ’ 은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 당나라 중엽 조씨 ( 趙氏 ) 부인이 지은 ‘ 부하제 ( 夫下第 남편의 낙방 )’ 에 관한 시는 이런 복잡미묘한 심경을 잘 보여준다 . 해마다 낙방이라는 고배를 마시니 가족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동네사람 보기에도 민망했다 . 깜깜하여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때 집으로 들어 오라고 부탁아닌 부탁을 해야했다 . 낙방생을 맞이하는 부인의 안타까움과 원망이 동시에 묻어난다 .
낭군께서 분명 남다른 재능있는데 ( 양인적적유기재 良人的的有奇才 )
어찌하여 해마다 그냥 돌아오시나요 .( 하사연년피방회 何事年年被放回 )
이젠 저도 그대 뵙기 민망하오니 ( 여금첩면수군면 如今妾面羞君面 )
오시려거든 날 어둑해지면 그 때 돌아오세요 .( 군약래시근야래 君若來時近夜來 )
제 3 자인 가족이 아니라 시험당사자였던 당청신 ( 唐靑臣 ) 은 대놓고 스스로 ‘ 낙제시 ( 落第詩 )’ 를 썼다 . 그 역시 낙방 후 고향으로 바로 오지 못하고 장계 ( 張繼 ) 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거의 거지몰골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 가족들은 아무리 표정을 감추고서 반갑게 맞이하려고 해도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 그건 부인이건 자식이건 모두 마찬가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무조건 반겨주는 녀석이 있다 . 마당에 있는 누렁이다 . 예나 지금이나 이 맛에 반려견을 키우는 모양이다 . 충견에게는 낙방해도 내 주인이고 급제해도 내 주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이다 .
급제하지 못하고 먼길을 돌아오니 ( 부제원귀래 不第遠歸來 )
처자의 낮빛이 반기는 기색없네 .( 처자색불희 妻子色不喜 )
누렁이만 흡사 반갑다는 듯 ( 황견흡유정 黃犬恰有情 )
문 앞에 드러누운 채 꼬리를 흔드네 .( 당문와요미 當門臥搖尾 )
방거사를 비롯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장을 포기하고 선불장으로 간 것은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당시 과거제도의 문란도 한 몫했다 . 실력있는 수험자는 차고 넘치는데 소수의 합격자는 이미 따로 내정되었다 . 모르긴 해도 방거사와 수재 ( 秀才 단하천연 본명 ) 거사도 실력과 상관없이 몇 번씩 낙방이라는 고배를 마셨을 것이다 . ( 물론 자랑할만한 일은 아닌지라 그런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 그래서 ‘ 과거장이 아니라 선불장으로 !’ 란 말 한 마디에 바로 필이 꽂힐 수 있었던 것이다 . 이후 마조대사 문하의 기라성같은 선불 ( 選佛 ) 들은 당나라 사상계와 종교계의 주류로 등장하게 된다 . 어쨋거나 과거장 출신들은 과거장 출신답게 주어진 몫을 다하고 선불장 출신들은 선불장 출신답게 자기본분을 다하면 될 일이다 .
글 원철 스님 / 불교사회연구소장 .
*** 이 시리즈는 대우재단 대우꿈동산과 함께 합니다 .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제11회 2004 조선조 과거 재현행사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 김태형 기자

텔레비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갈무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