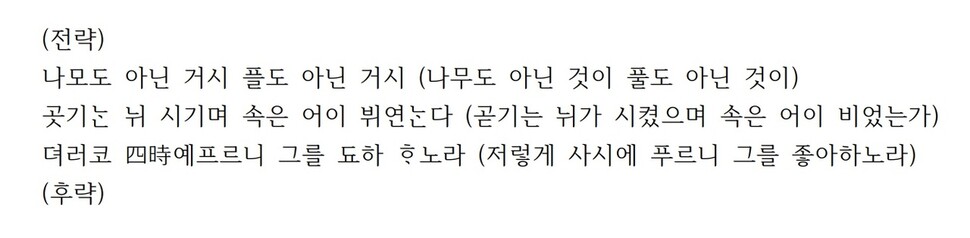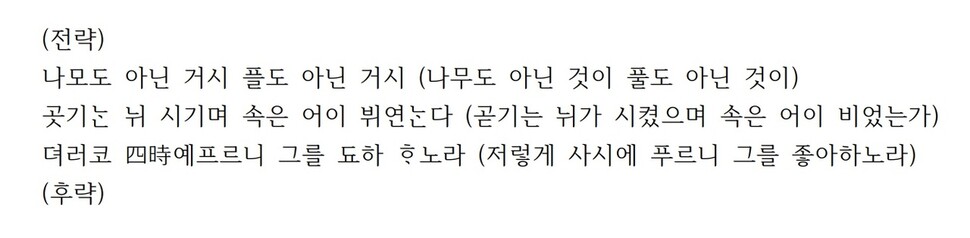대나무의 삶에 담긴 사연
고산(孤山) 윤선도의 질문
유명한 시조 한 수를 읽어보자.
고등학교 <국어>를 경험한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위 시조를 읽거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67~1671)가 유배를 마치고 해남으로 돌아와 56살에 지은 그 유명한 시조, 총 6수의 ‘오우가(五友歌)’ 중 제5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고산은 오우가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다섯 벗을 노래했다. 내 오래된 기억이 맞는다면, 이 오우가와 관련해서 단골로 나온 시험 문제는 위의 제5수가 노래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누구인가? 단박에 기억났을 것이다. 맞다. 바로 대나무다.
숲을 만난 뒤 이 시조를 여러 번 다시 읽으며 나는 고산의 시선이 새삼 반가웠다. 그가 대나무를 관찰하면서 저런 생각을 하고 또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다. 윤선도는 대나무를 형태적 측면에서, 또는 생리적 측면에서 남다른 시각으로 자세히도 살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우선 대나무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대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데, 그러한 삶의 꼴(生態)은 누가 시킨 것이냐고 묻고 있다. 아울러 속이 빈 까닭은 무엇이냐 묻는다. 그렇게 살면서도 사철 푸르다는 특징에 주목한다. 그것에서 인간으로서 닮고 싶은 인문적 덕목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
보길도 원림. 윤선도 유적지. 사진 완도군청 누리집 갈무리
고산의 저런 시선과 사유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대나무에 관해서 이전에는 거의 없던 시선이고 사유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쌓아온 문화 속에서 대나무는 주로 일상에 더 없이 요긴한 식물로만 인식되고 활용되었다. 이것을 대나무 입장에 서서 말하자면 대나무처럼 인간에게 꾸준하게 수탈을 겪은 식물도 드물었다는 것이다.(관련한 주장과 논거는 김종원, <한국식물생태보감 1>, 자연과 생태, 2015, 824~825쪽 참조)
조금만 살펴보자. 아직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절에 대나무는 종이를 대신한 소중한 자원(?)이었다. 알다시피 대나무를 엮고 그 위에 글씨를 써서 기록한 것이 죽간(竹簡)이고, 죽간으로 주고받는 편지를 특별히 죽찰(竹札)이라 부르기도 했다.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 때 불태워진 책은 당연히 종이책이 아니고 죽간으로 만든 책이었을 것이다. 대나무의 활용은 죽간만이 아니었다. 여름 무더위를 누그러뜨리는 지혜로 죽부인이나 대자리가 애용되었고, 대나무를 잘라 엮어 울타리를 치기도 했다. 연을 만들 때 그 골격구조 역시 대나무를 깎아 사용했고, 낚싯대의 재료로도 대나무가 사랑받았다. 또한 검은색을 띈 오죽은 곰방대의 재료로도 각광받았다. 봄철에 올라오는 대나무의 새순, 즉 죽순은 원기를 돋울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애용되었다. 맹종죽처럼 비교적 굵게 자라는 대나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소위 ‘대통밥’을 지어먹는 데도 사용하고, 구운 죽염을 만들 때도 사용한다. 대나무를 활용해 만든 광주리나 채반은 집집마다 여러 개씩 있었고, 조릿대로 엮은 복조리를 비롯해 다양한 가재도구가 대나무를 잘라 가공하는 행위에 기댔다. 화살의 재료로 쓰이기도 했고, 대금이나 단소, 퉁소나 피리 같은 악기 역시 대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또한 댓잎(대나무의 잎)으로는 차를 내어 마신다.
대개는 이렇게 대나무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친근한 자원 정도로 여기는 풍토 속에 있었을 텐데, 대나무가 왜 그 자신만의 특별한 꼴로 살며, 누가 그렇게 (속을 비운 상태로 높이 빠르게 자라며) 곧게 살라고 시킨 것이냐고 묻는 고산의 시선은 참신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가 나도 고산이 오우가를 지었던 그 나이를 막 지나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세월을 살았을 즈음 난세를 견디고 유배에서 돌아온 큰 선비가 대나무를 두고 읊은 감흥과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대나무의 생태를 살펴 이 시대의 언어로 답해보려 한다.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
고산이 대나무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으로 표현한 것은 칼 폰 린네(Carl von Linné, 1707~1778)의 업적에 기초한 현대의 식물분류 방법에 견주어 볼 때도 매우 놀라운 관찰이고 명명이다. 숲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풀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풀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서적으로 애매한 구석이 있죠.”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며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에 이미 나무가 붙어 있는데 왜 나무가 아니죠?” 대답이 이렇다. “저는 그런 분류에 크게 개의치 않고 식물을 마주하지만, 식물학은 나무와 풀을 명확한 기준을 두고 구분합니다. 아마 과학의 중요한 기초가 ‘개념화’와 ‘범주화’에 근원적 출발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용어나 개념, 정의가 명확해야 과학은 일목요연함을 잃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계-문-강-목-과-속-종’의 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맞게 세밀하게 분류를 하면서 대상을 범주화하지 않았더라면 생물학은 아마 어지러워 접근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포는 물론이고 DNA, 게놈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된, 생물학이 이뤄낸 눈부신 성취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전통을 따라 식물학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가 보면, 대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여러해살이 사철 푸른 풀’(김종원, 같은 책, 822쪽)로 분류합니다.”
그럼 식물학은 나무와 풀을 어떻게 구분할까? 크기나 줄기의 구조, 자라는 패턴, 심지어 용도 등의 기준을 두고 그 차이점에 따라 둘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가장 엄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이다. 나무는 ①단단한 목질부를 갖추고 ②물관부와 체관부 사이에 세포분열을 하면서 줄기나 가지를 매년 굵어지게 하는(부피생장을 하는) 형성층(形成層, cambium)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을 때에야 그 식물은 나무로 분류된다. 대나무는 ①의 조건은 갖추었다. 하지만 ②의 조건에는 벗어나 있는 식물이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대나무는 나이테를 만들지 않으므로 나무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나무는 조직해부학적으로 풀로 분류해야 마땅하겠지만, “형성층이 있다가 퇴화한 것이기에 볏과에 속하는 나무”로 보기도 한다.(김외정, “竹林, 대나무는 풀인가 나무인가”, <조경수>, 한국조경수협회, 2013년 7~8월호, 54쪽) 이렇게 볼 때,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라고 한 고산의 표현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 보인다.
한 가지 더, 대나무를 식물도감에서 찾는다면 나무(목본)도감에서 찾아야 할까? 아니면 풀꽃(초본)도감에서 찾아야 할까? <대한식물도감>처럼 온갖 식물을 통합적으로 다 수록해 놓은 도감에서 찾아야 할까? 어떤 도감이든 수록된 식물의 색인을 펼쳐서 ‘대나무’가 몇 쪽에 실려 있는지 찾아보라. 아마 ‘대나무’라는 식물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식물도감에서 ‘참나무’라는 식물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참나무’가 상수리나무·굴참나무·신갈나무·떡갈나무·졸참나무·갈참나무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인 것과 같이, ‘대나무’ 역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왕대(참죽), 죽순대(맹종죽), 시누대(이대), 조릿대(산죽) 등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세계에는 40속 5000여종이, 우리나라에는 4속 1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식물도감에서 특정 대나무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휴대용의 작은 도감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이 주로 보는 큰 도감에서 ‘왕대’나 ‘조릿대’처럼 구체적인 종명으로 찾는 편이 좋을 것이다.
곧기는 뉘 시킨 것이냐?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산의 질문과 만나보자. 그에 앞서 기억하고 정리할 것이 있다. ‘생태학(ecology)은 기본적으로는 서식지(oikos)의 로고스(logos)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문이다.’ 오우가에서 고산이 던진 질문, “대나무는 왜 그토록 곧게 자라는 것이냐? 누가 그것을 시킨 것이냐?”에 답하기 위해 앞에서 밝혀둔 생태학의 근본적인 기반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산이 말하는 대나무가 어떤 대나무인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대나무로 부르는 종류는 두 가지인데, 10~20m까지 시원하고 높게 자라는 왕대(참죽)나 맹종죽(죽순대)이 그것이다. 짐작건대 고산이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대나무 역시 이 범주일 것이다. 아마 키 작은 조릿대나 시누대 등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각종 책자나 광고에서 대나무 이미지로 만나는 그 대나무를 일컬었을 것이다. 여기서 살피는 대나무의 생태 역시 일반적인 대나무로 제한한다.
우리 산림학계의 보물 같은 식물생태학자 김종원 교수에 따르면 대나무 종류는 열대 또는 아열대가 원산이다. 근본적으로 더운 지방이 고향이고 그래서 한반도의 남쪽 지방에 주로 분포한다. 대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빙하기가 완전히 끝난 이후로 본다. 그 경로는 중국 남부나 동남아로부터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우리 땅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은 대나무가 볏과 식물임을 근거로 한다. 볍씨가 그렇듯 대나무의 씨앗 역시 저장물질이 풍부해서 자연 상태로는 저장이 쉽지 않고 잘 썩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생물기후학적으로 볼 때, 쉬이 썩을 수 있는 씨앗이 자연산포의 경로와 리듬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유입 시기는 한반도에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시대로 추정한다.(김종원, 위의 책, 823~824쪽) 이때부터 대나무는 숲정이에 식재되고 봄철 냉해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기후나 토양조건이 허락되는 지역까지 퍼져나가면서 농경문화에 필요한 각종 도구로 한반도 거주 인류의 사랑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대나무는 주로 어떤 공간에서 사는가? 대나무는 요즘말로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쯤에 제 서식지를 두고 살아가는 식물이다. 식물에게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이 다소 낯설 것이다. 하지만 태극(太極)이 머금고 있는 빛과 그림자의 특성은 식물의 삶에도 관통된다. 식물 역시 자신을 생하는 조건과 극하는 조건을 모두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저런 용어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 조건의 서식지에서 발아하고 살아가는 경우 그 식물을 시쳇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식물이라고 불러보자. 반대로 척박한 토양 조건에서 태어나는 경우를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식물이라고 해보자.
이제 그 흔한 민들레가 태어나 살아가는 공간이나 쇠뜨기가 태어나 살아가는 공간을 떠올려 보자. 그 공간은 대부분 척박한 땅으로 소위 흙수저의 삶을 부여받고 태어난다. 하지만 태극이 보여주고 있듯, 반드시 넘어서야 할 극(剋)의 조건(그림자)이 있다면 그 뒷면에는 충분히 생(生)하는 조건(빛)이 함께 있는 법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신에게 이로운 조건만, 또는 반대로 넘어서야 할 고난의 환경만 주어진 시공간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태극의 로고스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서 사는 민들레나 쇠뜨기의 서식지에는 숲 중심부와 달리 하늘이 한껏 열려있다. 따라서 마음껏 햇빛을 누릴 수 있다. 요컨대 양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빛은 비교적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인 것이다. 반대로 ‘산마늘(명이나물)’이나 ‘투구꽃’, ‘산삼’ 같은 풀들은 풀이면서도 비교적 비옥한 토양에 태어나 살아간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격이라 할만하다. 이들은 넉넉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에 태어나지만, 하늘을 가린 상층부의 식물들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햇빛에 제약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생명이게 하는 근원의 하나인 ‘빛’의 결핍이라는 문제가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는 숙제로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대나무 이야기는 다음 편 글로 이어집니다.
글 김용규(여우숲 생명학교 교장)
*이 시리즈는 대우재단 대우꿈동산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