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은희경. 장편 <새의 선물>로 1996년 제1회 ‘문학동네소설상’을 받으며 첫 책을 펴낼 수 있었다. 사진 문학동네 제공
소심하게 성실한 나는 집에서는 집에만 들어맞는 사람이 되고 만다. 소설가가 되려면 일단 일상과 단절된 공간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소를 옮겨 다니며 소설을 썼다. 작가 레지던스 시설에서부터 친구들이 빌려준 리조트, 외진 모텔, 낯선 나라의 단기임대 아파트까지. 가장 잊지 못할 장소는 역시 첫 책을 쓴 해발 1천m가 넘는 산꼭대기의 절이다.
내가 난생처음 혼자 여행을 떠난 것은 그보다 1년 전인 서른다섯 살 때였다. 10만원을 주고 노트북을 임대했지만 반드시 뭔가 쓰겠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집중적으로 ‘생각’이란 걸 해보고 싶었고 할 말이 생기면 쓰자는 마음이었다. 사흘 정도는 아무때나 자고 일어나고 먹고 걸었다. 두 아이의 엄마와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건실한 규칙을 깨고, 의무와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인 셈이었다. 그러고 나니 사회적 정답 대신 내 머릿속의 질문에 대해 써볼 용기가 생겨났다. 나는 왜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그런 정답을 따르고 있는가. 왜 온 힘을 다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딸, 아내, 여자, 인간, 한국사회의 여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질문이 다섯 편의 단편소설 습작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중편소설 한 편을 더 써서 총 여섯 편을 신춘문예에 응모했다. 그중 중편소설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내 사주를 본 어느 점쟁이가 그해부터 인생이 확 바뀐다더니 과연.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원고 청탁이 전혀 오지 않았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래도 스스로 도우면 하늘이 도와줄지도 모르니까 장편소설을 써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다니던 불교대학 스님이 계신 절로 들어갔다.
대각선으로 몸을 눕히면 책상 아래로 다리가 들어가던 작은 선방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대야의 물로 세수를 한 뒤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점심때가 될 때까지 소설을 썼다. 낮에는 책을 읽고 요사채에 나가 신문을 뒤적이고, 공양주 보살을 돕거나 산길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른 저녁을 먹은 뒤에는 다시 책상에 앉았다. 밤새 문종이를 비벼대는 날벌레와 청설모의 발소리가 잦아질 때까지. 소설 쓰기가 재미있었는데 아마 머릿속에 독자도 없고 자기검열도 없어서였을 것이다.
책상 앞에서 나는 나의 불온한 ‘진짜 생각’과 신랄한 ‘진짜 문장’을 찾으려고 애썼다. 다시 정답에 맞춰 사는 인생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려면 내 일상을 이루고 있던 훈련된 통념 속의 규율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따금 스님이 “은 보살, 좋은 글 쓰느라 고생이 많으시네”라고 인자하게 격려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죄송한 마음이 들곤 했다. 내가 도를 닦는 선방에 앉아 이렇게 삐딱하고 신랄한 글을 쓰는 걸 스님은 계속 모르셔야 하는데…. 그렇게 한 달 반을 보냈고 그 결과 나는 제1회 문학동네소설상 당선자로서 첫 책(<새의 선물>, 1996)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100쇄 기념 개정판을 내면서 처음으로 첫 책을 꼼꼼히 읽어봤다. 어째서 이 책이 나를 ‘첫 책이 대표작인 작가’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일까. 스마트폰과 와이파이의 시대가 아니어서 고립된 처지였지만 그때 나는 쓰는 자로서 단순화된 정체성에 만족했다. 깊은 산 속의 외딴 선방에 혼자 있었지만 귀신도 호랑이도 무섭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겨낼 수 있었다). 온종일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나로서는 커다란 호사였고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인생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그리고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내 삶을 열두 살부터 재구성했던 창작자로서의 배짱이 글에 에너지가 흐르도록 만들어준 것일까.
여전히 집 떠나기를 반복하지만 이제 나는 동네 카페에 나가 글을 쓰기도 한다. 일상의 공간에서 단절되어야 작가로서의 불온함을 장착할 수 있는 건 첫 책을 쓸 때와 똑같다. ‘바라보는 나’인 작가와 ‘보여지는 나’인 생활인. 그 변환의 지속력이 짧아졌을 뿐이다.
은희경 소설가
■그리고 다음 책들
타인에게 말 걸기
두번째 책이면서 첫 단편집이다. 뒤표지에 ‘낭만적 환상을 거부한 여성들의 외롭고도 자유로운 삶의 형식’ ‘친밀한 소통이 사라진 정황을 가차 없이 폭로하고 도덕적 정형에서 이탈하려는 삶의 충동’이라고 적혀 있다. 나는 인간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구조에 관해 썼다고 생각했는데, 여성 주인공이 가부장제나 일부일처제에서 이탈하려 한다며 ‘그렇고 그런 불륜소설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문화면 기사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문학동네(1996)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매 순간 예상치 않았던 낯선 곳에 당도하는 것이 삶이고, 그곳이 어디든 뿌리를 내려야만 닥쳐오는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어” 이 책의 뒤표지에 실린 소설 속 문장이다. 이 책이 출간된 뒤 얼마 안 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내 책 같은 건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쓰는 일에도 막막해졌었다. 누군가 가장 마음에 드는 내 책이 뭐냐고 물으면 이 책을 떠올리지만 웬일인지 그렇게 대답을 하지는 않는다.
문학동네(2014)
빛의 과거
소설가가 되면 쓰고 싶은 이야기 세 가지가 있었다. 왜곡된 어린 시절, 경제개발 시기 전라도 소읍의 건축업자 아버지의 삶, 1977년의 여자대학 기숙사. 앞의 두 가지는 <새의 선물>과 <비밀과 거짓말>로 비교적 빨리 썼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번번이 실패하는 바람에 25년을 끌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신입생 때와 현재를 오가는 것이 이야기의 얼개인데 주인공의 현재 나이가 60살이 돼버려서 연애담은 조금 빼야 했다. 어쨌든 끝냈기 때문에 내게는 해피엔드이고 재미있다고 느껴진다.
문학과지성사(2019)
장미의 이름은 장미
나의 가장 잘 쓴 소설은 최근작이라고 농담을 하곤 한다. 최근작에는 현재의 내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생에 진심인 나는 그 삶이 좋은 것이기를 바란다. 소설 속의 인물처럼 내가 위축되고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공감하려고 애썼는지, 고독 속에서 서로 연대했는지 묻는다는 뜻이다. 최근작인 이 책에서 나는 뉴욕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나’라는 이방인을 마음 깊이 수긍하게 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문학동네(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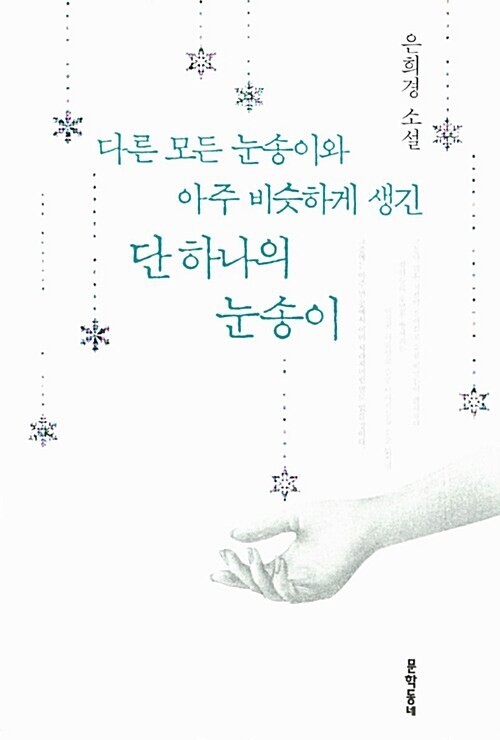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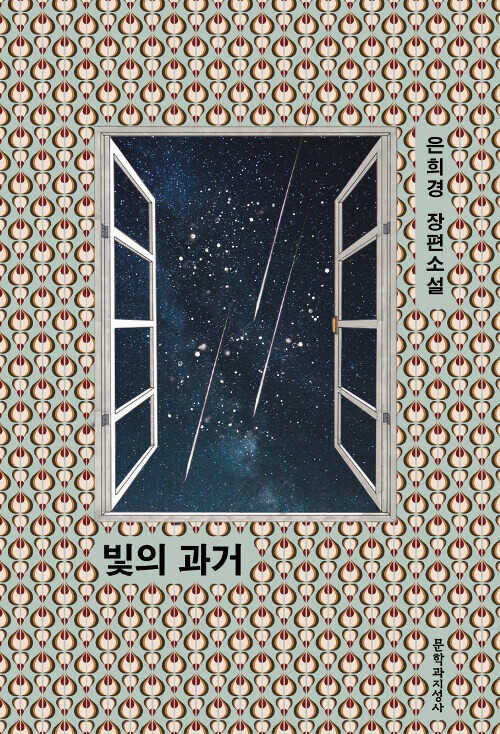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소설로 끄집어낸 4·3…뒤따른 고문과 수형 [책&생각] 소설로 끄집어낸 4·3…뒤따른 고문과 수형](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2/53_17032085959664_20231221503957.jpg)


![우주 생각하는 과학자도 세속에 붙들리네 [.txt] 우주 생각하는 과학자도 세속에 붙들리네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3/20250123504318.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