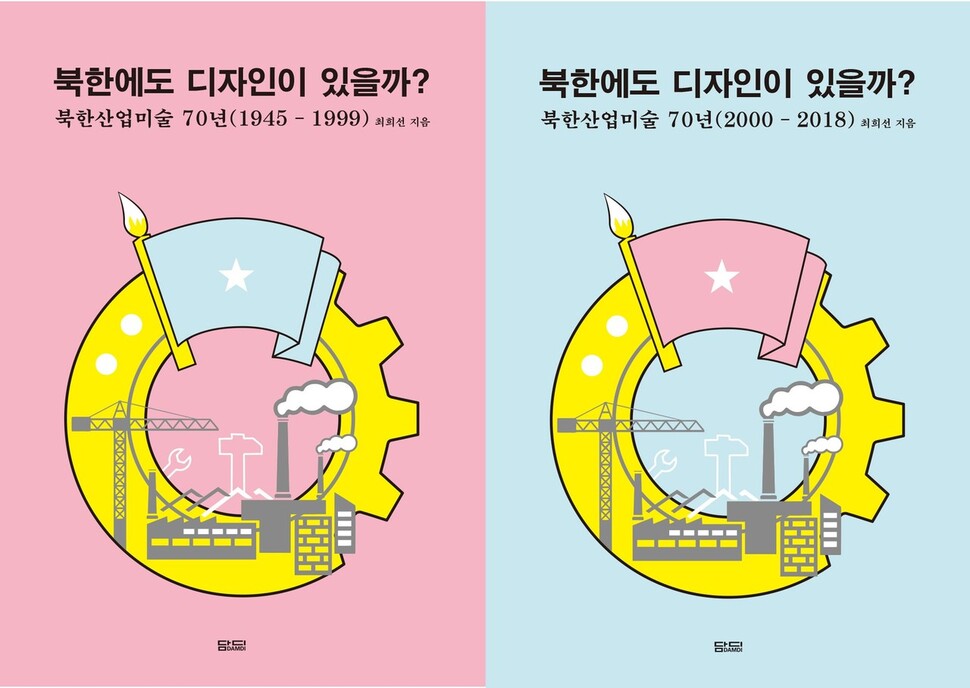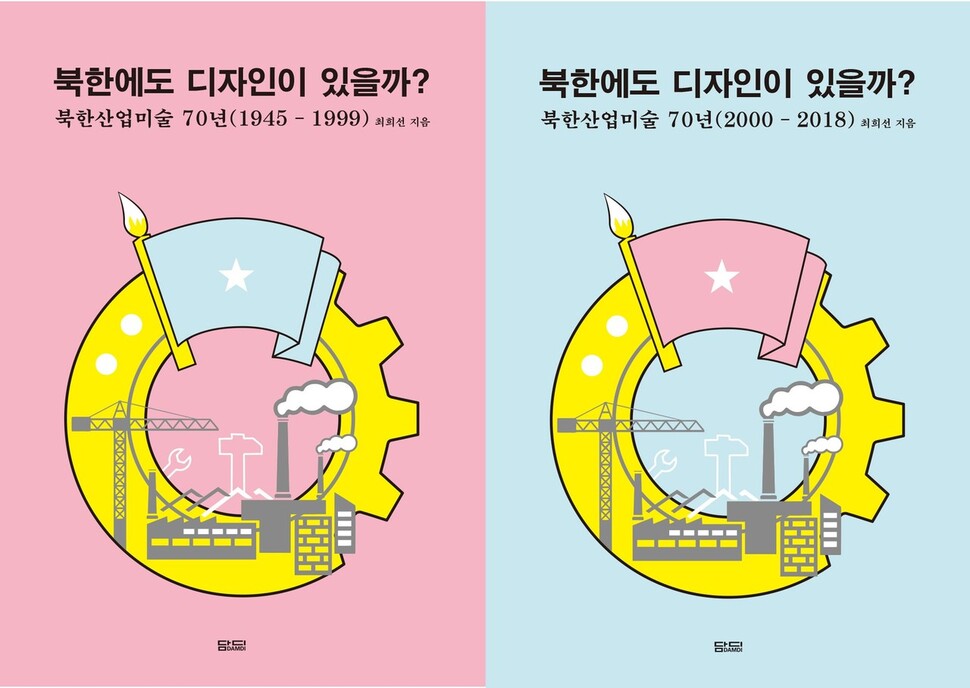북한에도 디자인이 있을까: 북한산업미술 70년(1945~1999)·(2000~2018)
최희선 지음/도서출판 담디(2020)
1970년생이고 구파발 인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내가 처음 만난 ‘북한 미술’은 한겨울 뒷동산이나 논밭에서 어쩌다 우연히 만나는 북한 ‘삐라’였다. 어려서부터 반공글짓기 대회, 웅변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을 만큼 투철한 애국애족 정신과 반공 사상으로 똘똘 뭉친 소년은 삐라에 적힌 문구조차 감히 읽어보면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고, 줍는 즉시 동네 인근 파출소 순경 아저씨에게 가져다줬다. 하지만 금지된 일일수록 더욱 소망하게 된다던가. 공책에 낙서하듯 그림 그리는 일을 즐겼던 나의 눈길은 저절로 삐라 속 그림으로 쏠렸고, 나도 모르게 ‘아! 그림은 참 잘 그리네’라며 찬탄하는 찬양·고무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쾌대, 변월룡, 조규봉 같은 월북 예술인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들의 작품을 접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이른바 권위주의 독재를 극복한 ‘좋은 시절’을 만난 뒤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남한에서 활동했거나 이른바 순수예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 예술가들이었다. 국내에서 드물게 출판된 북한미술 관련 책자들도 대부분 순수예술 분야의 월북예술가들이 중심이었다. 뭔가 갈증을 느끼던 찰나에 내가 몸담고 일하는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님 서재에 꽂힌 <북한에도 디자인이 있을까: 북한산업미술 70년>을 발견하여 흥미롭게 읽었다.
이 책은 북한 정권수립(1945년) 시기부터 2018년에 이르는 70년 산업미술의 역사를 모두 2권으로 구성한 책이다. 산업미술이라고 하니 조금 낯선데, 북한 <과학백과사전>에 따르면 “산업미술 : 제품의 형태와 색갈, 생활환경 같은 것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또는 쓸모 있게 만들거나 꾸리는 등 산업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미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책의 북한 원전 인용 부분은 북한어 표기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남한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산업미술’이다. 근대 디자인이 산업혁명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출발한 것처럼 ‘산업미술(디자인)’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예술과 경제, 역사의 결합체이기도 하다.
<북한에도 디자인이 있을까>는 디자이너이자 중앙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희선 선생이 지난 10년 간 북한의 산업미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총망라한 책이다. 두 권으로 분철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권이 5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단순히 디자인만 다루는 미술서적이 아니라 ‘산업미술을 통해 본 북한 사회 일상사’라고 부를 만하다. 북한은 디자인에서도 정치사상을 강조하지만, 산업디자인은 대중의 일상생활에 깊이 결부된 것이기에 곳곳에서 생활의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책에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1학년용 미술교과서(2001)를 비롯해 ‘갈매기 라지오(1964), 천리마 뜨락또르(1958), 금성 뜨락또르(2017), 소나무 학생가방(2017)’ 등등 모두 1천여 점의 도판이 풍성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요기가 된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북한 신문, 전문서적, 연감, 전시도록, 잡지 등 출판물부터 텔레비전 방영물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고 수집하는 각고의 노력을 들였다. 하지만, 정작 연구자 자신은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통탄할 현실을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황해문화>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