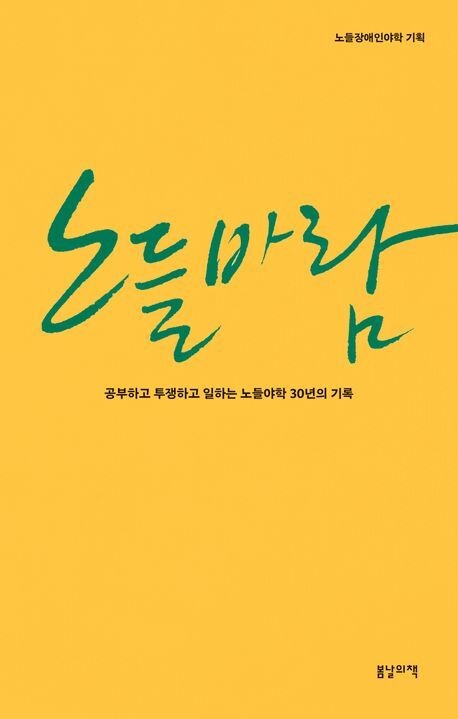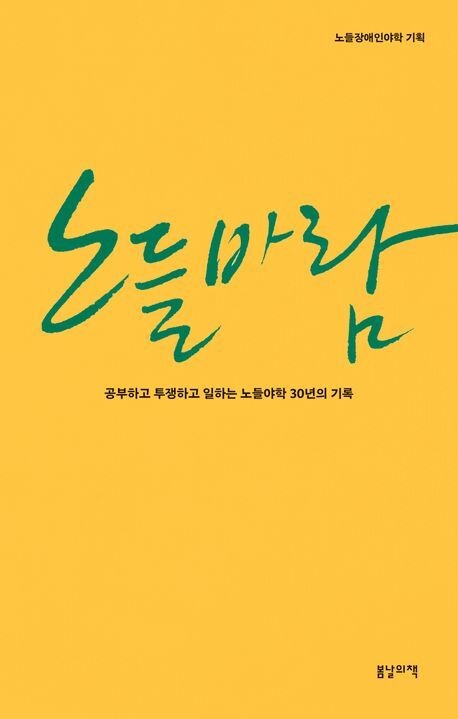노들장애인야학이 30주년을 맞아 펴낸 '노들바람' 표지.
장애 성인들의 교육공간으로서 우리 사회 장애해방운동의 ‘받침돌’이라 불려온 노들장애인야학(‘노들야학’)은 올해로
개교 30년을 맞는다. 노들은 ‘노란 들판’의 준말로 “차별과 억압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지향점을 가리킨다
노들야학이 개교 30년을 맞아 지나온 발자취를 담은 책 ‘노들바람: 공부하고 투쟁하고 일하는 노들야학 30년의 기록’(봄날의책)을 펴냈다. ‘노들바람’은 노들야학 개교 때부터 ‘부싯돌’, 이후 ‘노들바람’이란 이름으로 30년을 함께해온 소식지에 실렸던 글들을 담았다. “세상을 바꾸고, 자기 자신이 곧 역사가 된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2000편 넘는 글들 가운데 73편을 골랐는데, 이 어려운 일을 맡은 엮은이 한혜선 노들야학 교사는 “오랜 기억이 떠올라 자주 멈춰야 했고, 여기저기 박혀있는 그립고 애틋한 이름들로 자꾸만 먹먹해졌”다고 한다.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는 교훈처럼, 노들야학은 장애인이 ‘차별받는 존재’에서 ‘저항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공간이었다. 시설에만 머무르라고, 나다니지 말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뿌리깊은 차별에 맞서 탈시설과 자립, 교육권, 이동권 등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공부하고 투쟁하고 일해 온”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의 이야기가 ‘노들바람’ 속에 빼곡히 담겼다. 농성과 집회를 반복해야 했던 그 과정은 슬픔과 분노, 좌절의 연속이었으나 그 속엔 언제나 함께하는 기쁨과 희망도 있었다.
이렇게 30년을 이어온 노들야학은 과연 계속될 미래를 기약해야 할까. 이전에는 ‘노들야학이 더 이상 필요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꽤 있었다고 한다. 몸이 힘든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100%가 되면 ‘저상버스’란 말 자체가 필요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세상이 망해도 노들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곳은 살길이 막혀 세상 끝에 다다른 사람에게 ‘일단 밥을 먹으라’는 곳,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고병권의 말을 빌리면 “살길을 찾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 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