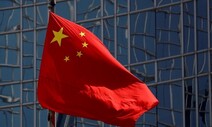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2차 회의에서 외국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진흥하기 위해 3년에 걸쳐 95억달러(약 13조3400억원)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120여 국가·지역이 함께한 이번 회의의 공동 주최국이었고, 앞으로 개최될 3차 회의엔 주최국으로 행사를 주도하게 된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외교’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중국 등 반대편에 선 국가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29일 공동성명을 내어 “한국이 장래에 열리는 세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주최한 1·2차 회의의 “뒤를 잇는 (3차) 회의의 바통을 한국에 넘겨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3차 대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등불(beacon)이며, 민주주의가 안보와 번영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세계에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중이 처절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배와 전쟁이란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야말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모범이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도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축사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 외교’의 최전선에 나서 깃발을 휘두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애초 이 회의가 구상된 것은 세계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변곡점에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분법적 세계관’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이 이끄는 민주주의 세력이 중·러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세력과 경쟁에서 이기도록 동맹국·동반국들을 결집해왔다. 이 노력은 외교·안보적으로는 쿼드(Quad) 강화, 오커스(AUKUS) 출범,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경제적으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세계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려는 ‘공급망 재편’ 작업으로 구체화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고립이 심화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강화됐다. 중동에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동맹’이 크게 훼손됐으며 이란 핵협정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 틈에서 미·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중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한국엔 사활적 국익이 걸린 북한과 대화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9일 연설에서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한-미의 ‘전략적 세계관’을 완벽히 일치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중·대북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전략적 자율성’을 스스로 제약한 것이다. 제일 앞줄에 나가 구호를 외치면 미국엔 박수를 받겠지만 상대가 던져대는 돌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김미나 길윤형 기자
mina@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사설] 끝없는 ‘감세’, 재정준칙 깨고 재정운용 ‘날림’ 치달아 [사설] 끝없는 ‘감세’, 재정준칙 깨고 재정운용 ‘날림’ 치달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21/53_17058302716549_202401215019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