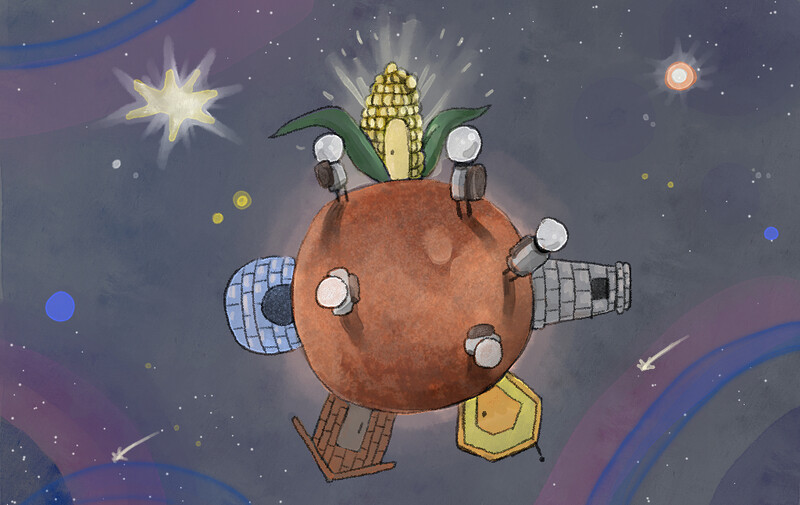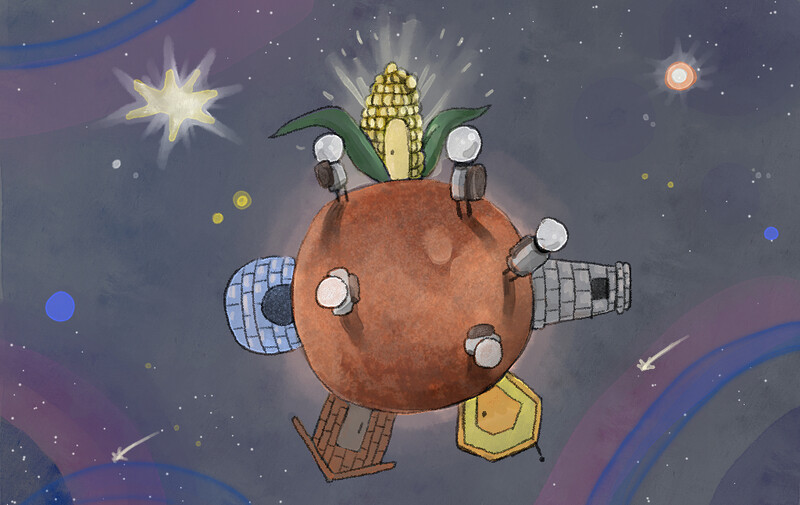더이상 이곳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구환경의 회복, 또 하나는 새로운 행성으로의 이주.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지구에서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인가 혹은 화성에서의 첫 세대가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고 그 갈림길에서 다양한 실험과 모색, 탐구를 하고 있다.
[김현아의 우연한 연결]
김현아 | 로드스꼴라 대표교사
졸업생 따슬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내가 일하는 여행학교 로드스꼴라를 마치고 건축학과에 진학한 학생인데 어느덧 졸업작품 전시를 한다고 연락을 해 온 것이다. 흐뭇하고 대견한 마음에 화분 하나 사 들고 대학에 당도하니, 썰렁하다. 머릿속에 삼삼오오 왁자지껄 다정하고 싱그러운 교정을 상상하고 있었나 보다. 상반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본격적으로 작품 준비를 하는 동안만 간간이 학교에 나와 후배들과 함께 작업했다고 따슬이 설명했다. 졸업작품전시는 의외로 재미있었다. 에코팜이라 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활성화시킨 모델, 복도를 운동장으로 바로 연결하여 학교 공간을 좀 더 개방감 있게 만든 그로잉스쿨(Growing School), 쪽방촌의 1층을 공동주방, 세탁실, 놀이방 등으로 개조하여 공동체 주택의 모습으로 변환한 모델, 아이와 노인이 만나는 장을 겹치고 교유하게 설계하여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도모한 건물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건축물로 풀어내는 시도와 작업이 흥미로웠다. 따슬은 버려진 채석장을 그대로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는데 핀란드의 템펠리아우키오 교회가 연상되었다. 이십대 초중반의 젊은 건축학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의외로 따듯하고 속 깊었다. 함께 사는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모순과 갈등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건축은 기술과 인문학이 어우러지는 장르인 거 같다고 하자 소재와 형태 면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는 분야라고 따슬이 말했다. 그 시대의 미학이 반영되면서, 요즘은 그린과 하이테크가 대세라 한다. 계급과 젠더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동시에 비전도 함축되어 있다고 말하는 청년건축학도의 눈이 맑다.
졸업작품전시회에 다녀온 며칠 뒤 우연히 <화성의 우주 건축가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따슬과 비슷한 나이대의 젊은 미국 건축학도들이 화성에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화성에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항공우주국은 2033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단다, 이들이 머물 집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다. 대기는 온통 이산화탄소로 가득하고, 중력도 없고, 물도 없고, 몇달간 모래폭풍이 일며, 기온은 영하 45도에서 영하 128도를 오가는 곳, 하루에도 적도와 남극을 오가는 기온차를 보인다는 그곳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는 사실 두번째 문제다. 왜 갈까? 그 혹독하고 황폐하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성에 왜 가고 싶어할까? 혹은 가야 한다고 생각할까? 달 탐사에 이어 화성 탐사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어쩌면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널 때 우주 정거장엔 햇빛이 쏟아진다’ 레드 플래닛 프로젝트는 은하철도999 같은 낭만과 공상 혹은 치기 같은 일이었을지 모른다. 막연한 동경과 공상이 포기할 수 없는 대안과 비전으로 바뀌고 있는 건 지구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더이상 이곳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구환경의 회복, 또 하나는 새로운 행성으로의 이주.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지구에서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인가 혹은 화성에서의 첫 세대가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고 그 갈림길에서 다양한 실험과 모색, 탐구를 하고 있다.
화성에서 집짓기가 가능한 것은 인공지능(AI) 덕분이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건축과 관련한 인류의 경험과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수백만가지 선택지를 비교해 화성에서 최적인 건축물을 제시한다. 그다음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건축을 한다. 물론 매번 이 실험을 화성에서 할 순 없다. 한번 발사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우주선에 여러가지 재료를 계속 실어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은 화성에서 모든 원재료를 스스로 찾고 만들고 가공해야 한다. 스스로를 ‘우주건축가’라 명명한 건축학도들이 선택한 재료는 화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과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 중합체다. 옥수수라니, 화성에 옥수수가 자란단 말인가. 물론 아니다. 화성의 토양은 지구에서 나는 갖가지 싱그러운 푸성귀와 곡물 따위를 길러내지 않는다. 옥수수는 화성에서 인공지능이 재배할 것이다. 흙이 아니라 인공배지에 수직농법으로.
네덜란드의 바헤닝언 대학은 농업분야 1위 대학이다. 이곳에는 생물학과 인공지능 로봇공학이 만나 극강의 효율성으로 농업생산성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비료나 살충제 따위 필요 없이 자외선과 적외선을 조율하여 광합성을 한다. 새싹부터 관리하여 흠결 없는 야채들이 재배되면 심도카메라와 자동로봇팔을 활용하여 수확한다. 이 기술은 화성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인간이 도착하기 전에 집을 짓고 식량을 재배해 창고에 저장해두고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인간의 감독 없이 상황을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 시속 160만㎞로 떨어지는 거대 암석을 버티며.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적들로 보이던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느새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낯설고 황막한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의 동지가 되고 있다. 인류의 척후병 혹은 프런티어가 화성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피엔스가 집적한 ‘모오든’ 지적 물적 유산을 빠짐없이, 가능한 한 치밀하고 섬세하게 전수해야 한다. 톰 소여의 오두막부터 에스키모의 이글루까지, 구석기시대의 움집부터 초고층빌딩까지, 새의 둥지부터 수달의 서식지, 꿀벌들의 집, 땅강아지의 거처까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엄혹한 환경에서의 집짓기는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폐기하고 버리고 방치했던 것들에도 어쩌면 다시 눈을 돌려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
대이야기의 시대가 열려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크리스퍼(유전자가위), 사이보그, 절멸과 이주…. 인류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전에 없던 재난의 시대라면 또다른 행성에서라면 어떤 경험과 기억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뭇 생명을 살리는 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화성으로 보내질 인공지능엔 불타오르는 지구에 두 발로 선 아이에겐 불굴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실패와 절망의 이야기도 격려와 위안이 될 것이다. 비범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구리고 찌질하고 비루한 이력 또한 난관을 돌파하는 힌트와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핵심이 아닌 것들, 요약본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들에 해(解)가 있을지도 모른다. 인공지능과 로봇과 인간의 뇌가 이어지고 있다. 농업과 건축과 우주공학이 만나고 융합하고 혼종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존재와 비존재가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다. 우연한 연결은 창발적 진화를 유발한다. 쪽방에서 스마트시티까지, 고금과 동서의 이야기, 당신과 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주건축가들이 만들 화성의 집은 첨성대와 몹시 닮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