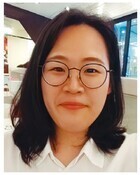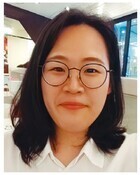52시간제 정시 퇴근 장려 모니터 화면이 켜진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서혜미 사회정책팀 기자
“금일 업무 목표 -정시퇴근”
얼마 전 친구가 뜬금없이 선물해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고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회사생활 하는 직장인이라면 하나같이 공감할 만한 이모티콘이었다. 엑셀 함수 서식을 비튼 “=HOME(집에 보내줘)”나 “아 뭘 하긴 해야 하는데 하기가 싫네…” 같은 문장이 엑셀 칸 모양에 있기도 하고, “퇴사”라는 단어가 색색의 도형 안에 들어 있기도 했다. 준 사람의 성의가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히 사용한다. 실수로라도 회사 사람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만약 내가 “돈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일하자”라는 이모티콘을 잘못 보내 선배들이 보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뒷덜미가 서늘하다.
우연히 얻은 이모티콘에 직군을 막론하고 주변 사람들은 꽤 호응해줬다. 초과노동이 일상인 사람일수록 더 그랬다. 동료 기자들, 특히 코로나19 취재 경험이 있는 기자들에게도 반응이 좋았다. 기자의 일은 사건과 이슈가 있으면 취재해 알리는 것이고, 이런 상황은 9~6시라는 통상의 업무 시간대와 무관하게 벌어지기도 한다. 코로나19 담당 기자로 예를 들 경우, 우리는 백신 사전예약이 저녁 8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약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기사를 새로 하나 쓰게 될 것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지난 7월 중순 50대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될 때 제발 문제가 안 생기기를 빌었던 기자가 아마 나 혼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직업을 택한 이상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삶이겠지만, 유독 코로나19 취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지 않아도 스파이크 단백질, 중화항체, 아나필락시스, 뇌정맥동혈전증 등과 같은, 평소 가진 지식으로 유추할 수 없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느라 매번 마감도 늦는 터였다. ‘기사가 이만하면 됐겠지’ 싶어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다가 다시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뛰어가거나, 백신 공급과 관련된 다른 매체의 기사를 보고 저녁 늦게 확인 취재하는 등의 상황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이모티콘을 선물해준 친구도 야근이 잦은 건 마찬가지라, 우리가 마음 놓고 노트북을 두고 나올 수 있는 평일은 금요일 밤 9~10시쯤이다. 가끔씩 만나 산책하면 “야, 나 진짜 이직 준비한다”, “일단 원서부터 쓰고 다시 얘기해라” 같은 대화를 초점 없는 눈으로 나눈다.
취업준비생 시절 들었던 현직 기자의 강의에서 ‘왜 기자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바르게 살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대답에 그 기자는 기자가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냐며 웃었다.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기도 하다.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을 때면 ‘좋은 사람’과 ‘좋은 직업인’이 양립 가능한 건지 회의에 빠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훌륭한 직업인의 성취라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착취해 얻은 결과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긴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배경엔, 배우자 같은 존재가 다른 중요한 일을 더 신경 써준 영향이 분명 있을 것이다. “아내가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 둘러댄 어떤 공직자의 과거 변명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정도야 다르겠지만 나 역시 가까운 사람에게 무신경해지거나 가족에게 더 많은 일을 떠넘기는 걸 피할 수는 없었다.
분야를 막론하고 이런 삶이 지속가능한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늘어나는 것 같다. 몇번 토론해봤지만 딱히 ‘이거다!’ 싶은 해답이 나오진 않았다. 다만 최근에 최소한 이 정도는 마음에 새기고 살자는 다짐 비슷한 걸 했다. ‘바깥일’이나 ‘큰일’ 하느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이전 세대의 서사를 절대 답습하지는 말자고. 우리에겐 ‘일잘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인의 윤리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목표는 정시퇴근이다.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