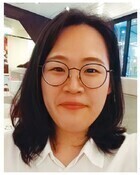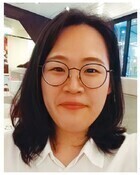서혜미 | 이슈팀 기자
“그래서 서 기자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몇달 전 머리가 희끗한 고위공무원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그가 어떤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물었다면 쉽게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전개될 국면에 관한 내 전망을 물었다. 그건 제가 물어볼 내용인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물대며 가까스로 말을 이어갔지만, 차라리 아무 대답도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입사 초 ‘출입처에서는 연차에 상관없이 너도 회사를 대표하는 한명의 기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초짜라고 헛소리하지 말고 처신 잘하라는 의미였을 텐데 처참히 실패한 날이었다.
간혹 내게 질문을 던지는 취재원을 만나면 크게 당황할 때가 있다. 직업 특성상 질문은 나의 몫이므로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까닭이다. 정부 부처, 정당, 기업 등을 담당하는 기자의 취재원은 대체로 중장년 남성에 편중돼 있다. 그들은 자신의 정견을 말하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입을 여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나는 그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또 질문하고, 다시 잘 듣고 기사를 쓰면 된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취재원들은 좋은 정책 입안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 나이대의 남성이, 심지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논리에 도취되지 않고 다른 집단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나를 그저 ‘어린 여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한명의 기자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취재원을 만나는 경험은 스스로를 낮추는 데 익숙한 저연차 기자에게 소중한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빛과 그늘은 같이 있는 법. 까닥 잘못하다간 비대한 자아의 소유자가 되기 쉽다고 느낀다. 사회부 기자가 일상적으로 전화를 하는 취재원만 해도 경찰서 과장이다. 다른 부서에 가면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종 부처의 실·국장, 큰 기업의 상무·전무 등과 연락할 텐데 기자 명함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과 말을 섞는 일이 있을까 싶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만났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쉽게 만나겠지만, 우리는 정식으로 면담 요청을 해도 만나기 쉽지 않다’고.
이런 사람들과 만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자의식 과잉에 빠지기 좋은 환경일 것이다. 실제로 기자 사회에선 자신이 어떤 사람을 알고, 누구와 술을 마셨으며,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과시하는 사람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건 우리의 일이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처음 보는 취재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장’들을 아는지를 계속 늘어놓는 것처럼 말이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나도 이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백하자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으니 취재원 앞에서 허세를 부리곤 한다.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아는 체하다가 머쓱해진 적도 여러번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불도 같이 바뀌는데, 내가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심란함에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이는 일은 사계절 내내 변함없었다. 연차가 쌓이고 아는 게 많아져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기자일수록 남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어줄 텐데 더더욱 본인을 과대평가하게 되지 않을까? 비판과 조언을 무 자르듯 구분하는 게 어렵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취재원에게조차 훈수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고연차였다.
나는 다를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는 일 자체가 오만함의 증거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내 모습도 자의식 과잉자일 수 있겠다. 그래도 제정신으로 살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낸데’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질문을 잊지 않고 떠올려야겠다. “너 혹시…뭐 돼?”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