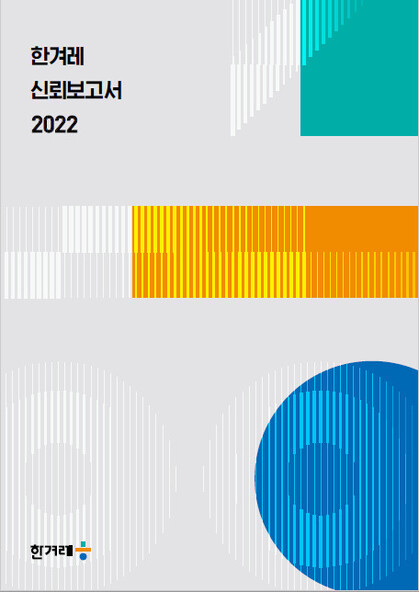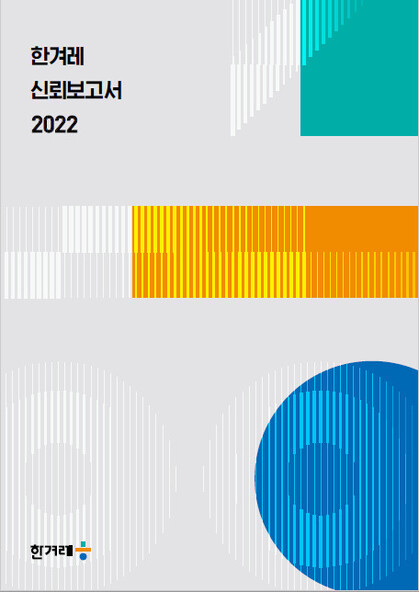한겨레가 신뢰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걸 뽐내기 위함이 아니다. 그보단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다.
특종과 속보를 다퉈왔던 우리 언론들이 앞으로는 ‘믿을 수 있는 보도’라는 또 다른 경쟁장을 하나 더 갖게 되길 바란다. 한겨레가 그 경쟁에서 힘겨워야 한다.
“김창숙 교수(이화여대) 연구팀의 분석 자료를 보면, <한겨레>는 조사대상 언론사 가운데, 제목과 주제의 타블로이드성 지수가 각각 49.4, 15.7로 14개사 평균치인 61.9, 30.4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만큼 <한겨레>가 타블로이드성 기사 생산 및 제목의 선정성 등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지난 23일 한겨레 누리집에 공개한 150쪽 분량 ‘
한겨레 신뢰보고서 2022’의 한 대목이다. 한겨레가 디지털에서 클릭 수를 유도하기보다는 정도를 걷고 있음을 자랑하는 글이다. 보고서 초안을 주요 간부들이 회람했는데, 편집국 간부인 한 후배가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선배, 그런데 좀 찔려요. 우리도 페이지뷰(PV) 등 신경 많이 쓰고, 그래서 늘 경계가 어딘지 고민하는데…”라고 했다. 최종본에서 그 대목 뒤에 다음 한 문장이 더 붙었다. “그러나 한겨레 내부에서도 수익성과 연결된 페이지뷰를 늘 의식하고 있으며, 언론의 품격과 신뢰 그리고 대중성 사이에서, 특히 제목 선정 및 기사 배치 등을 놓고 늘 갈등하고, 고민하며 매번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
품격과 대중성 사이…‘너네는 잘하고 있느냐’ 무거운 질문
한겨레가 첫 ‘신뢰보고서’를 펴냈다. 2020년 확대·개편한 한겨레 취재보도준칙 항목의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그 연례보고서를 ‘신뢰보고서’로 명명했다. 신뢰 언론을 ‘향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준비 과정 논의장에서 자주 나온 얘기가 “우리 자랑만 늘어놓아선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과, 한편으론 “잘한 걸 일부러 숨길 필요는 없지 않냐”는 것이었다. 한겨레 책무위원을 맡고 있는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한겨레 기사를 비평하는 ‘책무실 통신’을 보낼 때마다, 스스로에게 ‘너는 기자 때 잘했느냐’고 묻게 된다고 한다. 심 교수는 <에스비에스>(SBS)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취재보도준칙을 외부에 설명할 때마다, 그리고 이번 신뢰보고서를 발간하면서도 비슷한 부메랑 질문이 한겨레에 현재형으로 돌아온다. ‘너네는 말처럼 잘하고 있느냐’라는. 이 신뢰보고서는 자화자찬과 과공비례 사이에 서 있는 듯하다.
25일 열린 열린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에서 신뢰보고서를 받아본 이명재 위원(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다. “외부 교수들이 한겨레 기사를 지적한 글이 보고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보단 콘텐츠와 관련한 한겨레 내부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느냐 하는 것이 더 많이 담겨야 했다”고 말했다. 정곡을 찔렸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겨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결정들을 (사관처럼) 일일이 체크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지 않고, 우리 내부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내부 구성원들의 콘텐츠나 행위를 비판하고 문서화하는 것인데,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는 건 아닌지, 실수에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겨레 내부 합의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험과 역량이 더 쌓이면 우리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많이 공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겨레가 신뢰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종착점에서 번쩍 손들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걸 뽐내기 위함이 아니다. 그보단 달리는 길 위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한겨레를 바라보는 외부에서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숙제다.
아울러 외부 책무위원들이 저널리즘 시각에 입각해 전해주는 ‘책무실 통신’ 글은 한겨레 기사를 바탕으로 한 비평이지만, 다른 언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컸다. 정성스레 보내준 글을 볼 때마다 ‘우리만 보기 아깝다’는 마음이 있었다. 한겨레 구성원 모두가 ‘책무실 통신’ 글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인으로서 새겨들어야 할 말이 많다고 본다.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인데, 특정 언론만 고고히 높은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한겨레가 언제까지 비교우위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한국 언론이 정파성 시비에서 여전히 벗어나진 못하고 있지만, 자살·범죄 보도 또는 차별·혐오 용어 등에서 보듯 다른 분야에선 최근 인권 의식이 많이 개선됐고, 젊은 기자들의 취재윤리도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특종과 속보를 다퉈왔던 우리 언론들이 앞으로는 ‘믿을 수 있는 보도’라는 또 다른 경쟁장을 하나 더 갖게 되길 바란다. 한겨레가 그 경쟁에서 힘겨워져야 한다.
저널리즘책무실장·논설위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