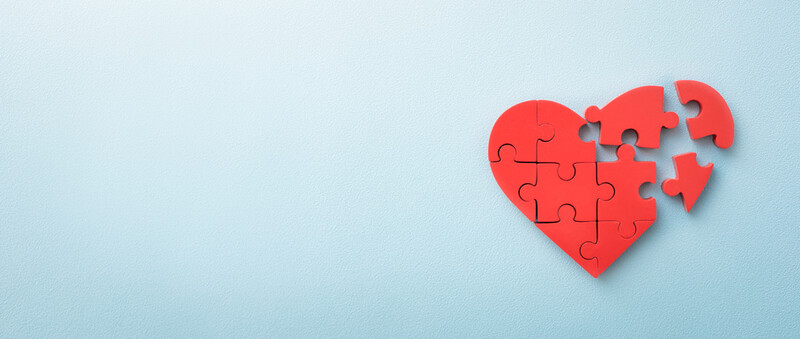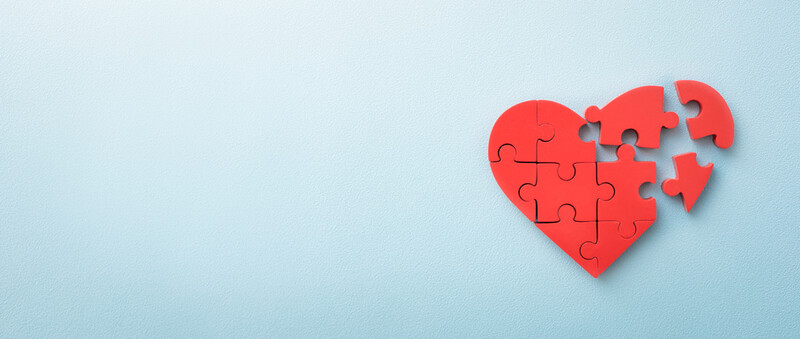조기현 | 작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돈 빌려달라거나 결혼한다는 소식은 아니었다.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 이제 취업해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말이었다. 갑자기 끊어버린 관계의 무게를 내내 품었을까. 연락 끊긴 이유를 묻기도 전에 먼저 말해줘서 고마웠다. 기꺼운 마음에 만날 일정부터 잡았다.
친구는 경기도의 한 공공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동안 그를 처음 만난 때를 되짚었다. ‘배민’ 같은 배달 앱이 나오기 전 동네 식당별 메뉴와 번호가 담긴 책자가 있었는데, 그걸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다. 13년 전이다.
배포를 시작하면 봉고차 한 대에 열명이 구겨져 탔다. 차가 주택지에 멈추면 각자 퍼져서 책자를 배포하고 다시 모여 차에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첫날 나는 사람들의 배포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책자를 들고 건물의 입구를 파악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숙련이지 싶었다. 그때 한 사람이 나를 따라와서 귓속말로 노하우를 전했다.
“적당히 붙이고 어디 신발장 뒤에나 사장님이 못 찾을 데다 묶어서 버려요. 다들 그래요.”
덕분에 그곳의 룰을 터득했다. 금세 나도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퍼지고 모이길 반복했다. 구겨져서 봉고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운전하는 ‘사장님’은 매번 아저씨들을 의심했다. 어디 버리는 거 아니냐는 사장님과 의심을 되받아치는 아저씨들의 대화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실소가 새어 나왔다. 그도 옆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꼭 장진의 희곡이나 영화에 나올 거 같은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극과 영화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중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다.
우리는 공장은 달랐지만 같은 시기에 산업기능요원이었고, 서로 예술을 하고 싶어서 직장을 관둘 때도 같은 인력사무소에 ‘노가다’를 다녔다. 친구는 배우로 무대에 서고 싶었지만 기회가 마땅치 않았다. 우리끼리 해보자며 두번 정도 작은 공연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내가 공연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 뒤로 친구는 일을 구해도 적응하지 못하고 관두는 경우가 잦았다.
오랜만에 본 그의 얼굴에서는 피로감 묻어나던 쓴웃음이 사라져 있었다. 자활 일자리로,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를 지원한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시민을 만나 복지 정보를 설명해주고 서류 준비를 돕는다. 최근 난방비 문제처럼 복지 이슈가 터지면 1, 2주 정도 매일매일 100여명 사람이 주민센터를 찾는다.
아무리 업무 강도가 낮은 자활 일자리여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어렵다. 더군다나 삶이 위기에 몰린 시민들이 공공행정 앞에서 얼마나 날카로울까. 당장 나부터도 그랬다. 그러나 친구는 이 일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했다. 처음부터 잘 맞은 건 아니었단다. 첫날부터 주민센터 입구에 앉아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을 듣자니 마음에 상처가 났다.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마음이 바뀐 계기는 늦잠이었다. 며칠 일을 나가다가 늦잠을 자버렸다. 원래 일을 하지 않던 습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포기하듯 잠이 들었다. 11시쯤 됐을까.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혹시나 고독사한 건 아닐지 걱정돼 와봤다고 했다.
“그 말에 희미해지던 삶이 또렷해졌다니까. 주민센터에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랑 내가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음날부터 각종 복지제도 종류와 신청 기준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쉬운 말로 상담도 잘한다. 최근 생애 첫 연애도 시작했다. 새살이 돋는 듯한 친구의 삶에 덩달아 내 마음에 새살이 돋는다. 삶의 의지를 더해준 관심과 관계들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는, 그저 그랬던 말이 새삼스레 경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