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인간 중심의 미화된 해석 아닐까? 야생에서 야성 그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 아닐까? 중성화 수술은 폭력이 아닐까? 개나 고양이처럼 인간을 따르는 동물만 특별히 여기는 것도 차별 아닐까? 동물에 대한 애정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연결된 것은 아닐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조형근의 낮은 목소리
1. “코루야, 코루야!” 온 동네가 시끄럽다. 나를 찾는 목소리다. 내 이름은 코루, 만 네살쯤 된 고양이다. 자칭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 아파트에 살다가 올해 초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왔다. 집은 작은데 마당이 넓고 담도 없다. 마당에는 잔디밭도 꽃밭도 텃밭도 있다. 뒹굴기도 하고, 벌레도 잡고, 나비·잠자리 쫓기 놀이도 한다. 하루에도 몇번씩 엄마, 아빠, 할머니를 졸라 마당에 나온다.
지금은 일요일 오전, 엄마 아빠는 마당에 나무를 심고 있다. 마당에서 노는데 문득 더 큰 세상이 궁금해졌다. 가끔 옆집에 놀러 가거나 길 건너 앞집 사는 삼거리파 고양이들과 실랑이를 벌인 적은 있지만, 엄마 아빠 없이 혼자 다닌 적은 없다. 둘이 일에 열중한 틈을 타 길을 건넌다. 삼거리파 고양이들이 안 보인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향한다.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 이곳저곳 살핀다. 신기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온 동네를 울리는데 여기만 못 찾는다. 재미있어서 계속 숨어 있다가 한참 만에 나갔더니 엄마, 아빠, 할머니, 앞집 아줌마까지 나를 보고 소리 지른다. 엄마가 나를 와락 안는다. 스타가 된 기분이다. 이 맛에 마당냥이다. 다음에는 더 멀리 가 볼까?
2. 나는 코루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아빠를 자처하고 있다. 조금 전 아이를 찾느라 식겁했다. 요즘 들어 바깥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커진 듯하다. 코루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진다. 상상일 뿐이라도. 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사람도 힘든 세상이다. 동물 학대는 규탄하지만, 가족이나 반려자라는 생각에도 위화감을 느꼈다. 처는 나보다 더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모든 것이 동네에서 시작됐다. 2018년 무렵, 동네책방의 ‘월간 이웃’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고양이 키우는 이웃 이야기를 들은 처가 고양이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듬해 길고양이 한 마리가 책방에 들어와 눌러앉았는데, 중성화 수술 후 며칠 우리 집에 머물렀다. 아이는 정성껏 돌봐준 처의 껌딱지가 됐다. 이웃집에 입양 간 다음에도 가끔 만나면 반갑다며 처의 무릎에 올랐다.
그 후에도 입양 생각은 없었다. 늘 바쁜 삶, 고양이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나고 보니 여유가 있어서 입양하는 게 아니었다. 나비의 날갯짓 같은 우연으로 여기까지 왔다. 2020년 5월쯤이었다. 구조된 길고양이를 임시보호할 집을 찾는다기에 한두 주면 입양 가겠거니 하고 맡았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다.
구조자들이 예약해둔 중성화 수술 중에 수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암컷이라는 구조자들의 말에 확인 없이 배를 절개했는데 이미 중성화가 된 수컷이더라는 것이다. 황당한 의료사고였다. 한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마취 중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 검사해 보니 큰 병이 의심된다고. 이틀 뒤 초음파 검사에서 비대성 심근증 확진 판정이 나왔다. 길어도 1년을 못 산다는 진단이었다. 구조자 두분이 울었다.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데 황망했다. 얼마 못 살 아이를 누가 입양할까? 그날 밤 처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말했다.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던 처는 결국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1년을 못 넘긴다던 아이는 3년 반 넘게 잘 살고 있다. 웬일일까? 지난해 여름, 아이 발톱을 깎다 피가 멎지 않아 고양이 전문병원을 찾았다. 병이 있다고 말했더니 수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오진입니다. 그 병이라면 이렇게 오래 살 수 없어요.”
의료사고도 오진도 나쁜 일이다. 지금도 화가 난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에게 새 식구가 생겼다. 생활도 조금 바뀌었다. 새옹지마다. 뿌리 없던 삶에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약간 생겼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동물도 사람을 돌본다.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방에 격리된 채 앓는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침대 속에서 함께한 코루다. 평소엔 같이 자지 않던 아이인데 큰 위로가 됐다. 얼마 전 처의 두번째 코로나 때도 똑같았다. 아픈 걸 알고 돌봐주는 것만 같다. 지난해 초 큰 교통사고 뒤 우리 집에 사시다가 앞집 1층으로 이사 온 장모님께는 코루가 가장 가까운 말 상대다. 우리가 집을 비운 낮 시간, 현관을 열며 “할머니 왔다” 하면 쪼르르 달려나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지나가던 이웃,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코루를 보고 인사한다. 늘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긴다.
3.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인간 중심의 미화된 해석 아닐까? 야생에서 야성 그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 아닐까? 중성화 수술은 폭력이 아닐까? 개나 고양이처럼 인간을 따르는 동물만 특별히 여기는 것도 차별 아닐까? 동물에 대한 애정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연결된 것은 아닐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돌려보낼 야생은 우리 인간이 이미 없앴다. 이들은 수천, 수만년간 인간과 함께 진화해왔다. 개 덕분에 숙면을 취하게 됐고, 고양이 덕분에 곡식을 아꼈다. 이제는 필요 없다며 떠나라고 하기엔 쌓인 공감이 깊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더 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물을 사랑한다며 ‘민폐’를 끼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집에 코루를 보내준 이들을 보니 원칙이 분명했다. 위기에 빠진 개체만 구조했고, 번식력 왕성한 아이들을 찾아 중성화 수술을 시켰다. 모두 회비를 모아서 했다. 비인간 존재와 함께 사는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윤리적 ‘진화’의 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20세기 초 미국의 작가 잭 런던의 대표작 ‘야성의 외침’에는 ‘벅’이라는 이름의 개가 등장한다. 판사 집의 사랑받는 반려견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알래스카의 썰매 개가 되어 ‘몽둥이와 송곳니의 법칙’을 배운 끝에 야성을 되찾고 늑대의 세계로 돌아간다. 강자만 살아남는다는 사회진화론적 신념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한 거친 이데올로기일 뿐이지만, 신봉자들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쓴다. 자꾸 마당을 넘어가는 코루가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속마음을 어찌 알까? 다만 그곳이 거친 약육강식의 세상은 아니리라고 믿고 또 바라는 것이다.
사회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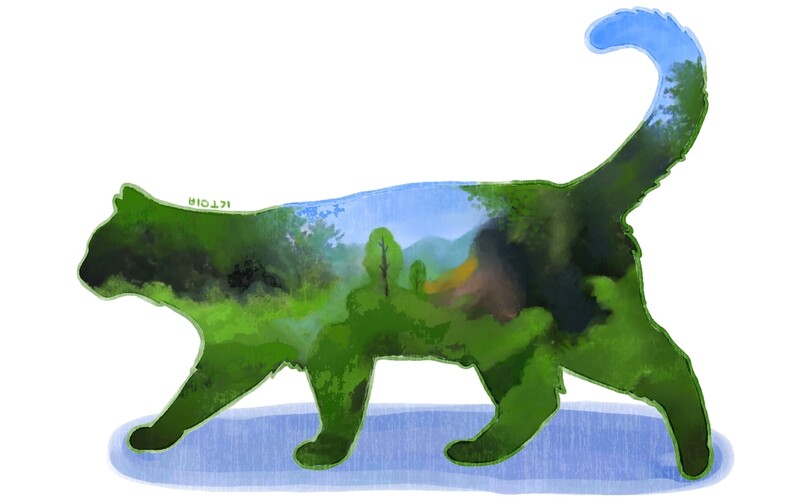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조형근의 낮은 목소리] 조 교수, 조 박사 그리고 조노마 [조형근의 낮은 목소리] 조 교수, 조 박사 그리고 조노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6/53_17035844567932_20231226502816.jpg)
![도사·목사와 내란 [한승훈 칼럼] 도사·목사와 내란 [한승훈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6/20250126502000.webp)
![분노한 2030 남성에게 필요한 것 [슬기로운 기자생활] 분노한 2030 남성에게 필요한 것 [슬기로운 기자생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0179.webp)
![가스 말고, ‘공공풍력’ 하자 [한겨레 프리즘] 가스 말고, ‘공공풍력’ 하자 [한겨레 프리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6/20250126501660.webp)
![차기 정부 성공의 조건 [세상읽기] 차기 정부 성공의 조건 [세상읽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6/20250126501723.webp)
![[사설] 윤석열 구속기소, 신속한 재판으로 준엄히 단죄해야 [사설] 윤석열 구속기소, 신속한 재판으로 준엄히 단죄해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6/2025012650181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