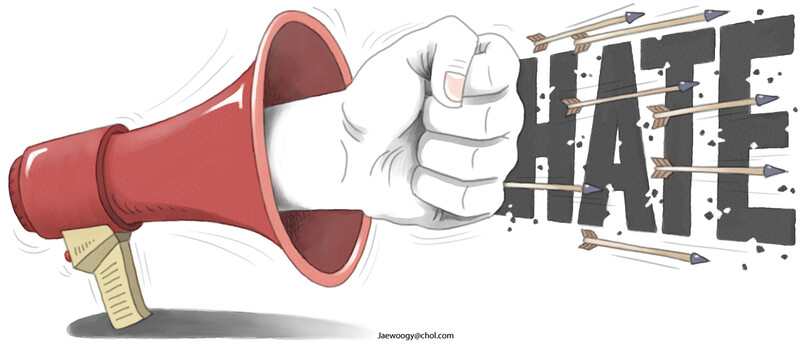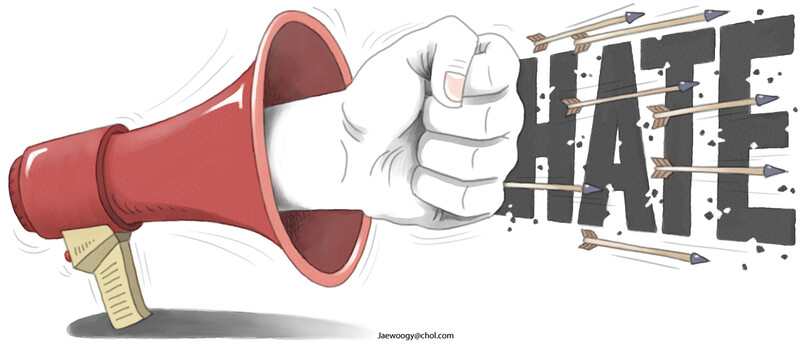이경자│소설가
택시 기사님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대통령을 욕했다. 2~3년 전 일이다. 마치 봇물이 터진 듯했다. 그분의 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대강 정치를 잘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중에 서민 집값과 실업률과 무언가 문란해진 듯한 사회 현실에 대해 특히 화를 많이 냈던 것 같다. 이럴 때, 그러니까 단 두 사람뿐인 좁은 공간에서, 그것도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며 서로 다른 생각 중의 이것저것을 꺼내 들고 옳다 그르다 다투는 건 짐짓 어리석어서 거의 듣기만 했다. 하지만 승객에 대한 일종의 가해행위인 건 분명했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차분함은 할머니 나이가 내게 준 선물. 더군다나 아직 목적지에 닿으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기사님, 어떤 나라에선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면 잡아가요. 그런 데도 있대요.”
농담하듯 말했다. 이 말에 기사는 잠깐 흠칫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곧 욕은 다시 이어졌다. 다시 내가 말했다.
“기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이 증오를 가라앉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정치예요.”
희한하게도 택시 기사는 나의 이 말에 곧장 누그러들고 심지어 공감하셨다. 기사가 푹 수그러든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한 가지는 잘한 거 같네요.”
“저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던 서민들이 먼저 죽을 거예요.”
택시 기사가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여겨져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사는 더는 흥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많이 다를지언정, 전쟁에는 반대하며 그 반대가 서민들이 가족과 오순도순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는 데에 마음이 모인 셈이었다.
요즘 들어 이날의 일이 뜬금없이 떠오른다.
하지만 돌아보면 나도 전쟁광이었던 때가 있었다. 싸움이라면 어린 시절 앞집 친구랑 공기받기 놀이를 하다가 끝내 의견이 갈려 머리끄덩이를 휘어잡고 싸운 것이 전부인 내가 전쟁을 학수고대한 건 청춘의 한 시절이었다. 강원도 작은 읍내에서 서울로 와 의지가지없을 때,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 소망이 있긴 했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지만 서울은 화려하고 부자들은 넘쳐나고 그래서 내 존재는 더욱 주눅 들고 초췌해지고 열패감에 시달리게 될 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전쟁이 터져서 너나없이 폭삭 망하고 죽는 꼴’을 보는 것이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960년대엔 존재를 파괴하는 마약이라는 게 요즘처럼 널리 퍼지지도 않아 사회에 가지는 욕구불만을 풀 길은 하여튼 전쟁이 터지는 걸 꿈꾸는 것뿐이었다.
이 욕망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도 무언가를 얻고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지면서 은근슬쩍 사라졌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뒤론 전쟁이 날까 두려웠다.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였다. 맘에 들지 않고 정말 싫은 권력에도 밉보이지 않으려 딱 선을 긋고 그 선을 지켰다. 앙칼지게. 혹여 잡혀가면 내 자식은 어쩌라고!
그래서 하는 생각인데,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게 하고, 지켜낸 것이 다른 이들에게 당당하며 그 과정에 한낱 부끄러움이 곁들 수 없는 상태가, 혹시 평화의 모습 아닐까? 내가 지켜내야 할 것들이란 기실 다른 이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지켜주려 할 것. 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까지 지켜주려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가 일상적일 때,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 도움을 주고받는 마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게 맞다면 평화는 참 자연스러운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고마워하는 것.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스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물으셨다.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미움이 가득 찼을까요?”
나는 촐싹대며 답했다.
“저는 분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내 답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딱히 이 대답을 바라신 게 아니란 걸 이내 눈치챘다.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큰 것이 우리들의 정신처럼 된 ‘증오심’이라는 걸 짐작해보면서 스스로 좀 부끄러웠다. 그분의 고민과 슬픔 중엔 미움 말고 이 시대의 놀라운 기술 문명도 있었다.
“나 같은 노인네도 은행에 안 가고 전화기로 돈을 보내니….”
나날이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 문명. 인간소외에 대한 공포감. 그분의 어감에서 느껴졌다.
사실 미움의 에너지로 굴러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솔로몬의 재판’이 있다.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며 다투는데 솔로몬이 그럼 아이를 반으로 갈라 가져라! 판결했다. 그러자 한 어머니가 놀라서 울며 자신이 양보할 테니 아이를 반으로 가르지 말라, 그럼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다. 솔로몬은 양보한 어머니가 친어머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옳은 것을 판단하는 가장 근본 잣대는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다.
우리가 정부 책임자나 영향력이 큰, 높은 데서 일하는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결국 진부하기 짝이 없는 말, ‘사랑’이다.
우리 사회는 젊은이 자살률이 높고 결혼과 출산율은 낮으며 실업에 대한 공포와 절망이 공기처럼 가득 차 있다. 부정한 일로 돈을 벌고 남을 속여 재물을 갈취하는 현실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한탕’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 지금도 파괴적 욕망으로서의 전쟁을 바라게 하고, 두려움 때문에 몰아의 약물에 빠져들며, 오로지 달콤한 말에 영혼을 맡기게 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이 현실에 대해서도 통렬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장 영향력이 큰 권력의 부문부문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