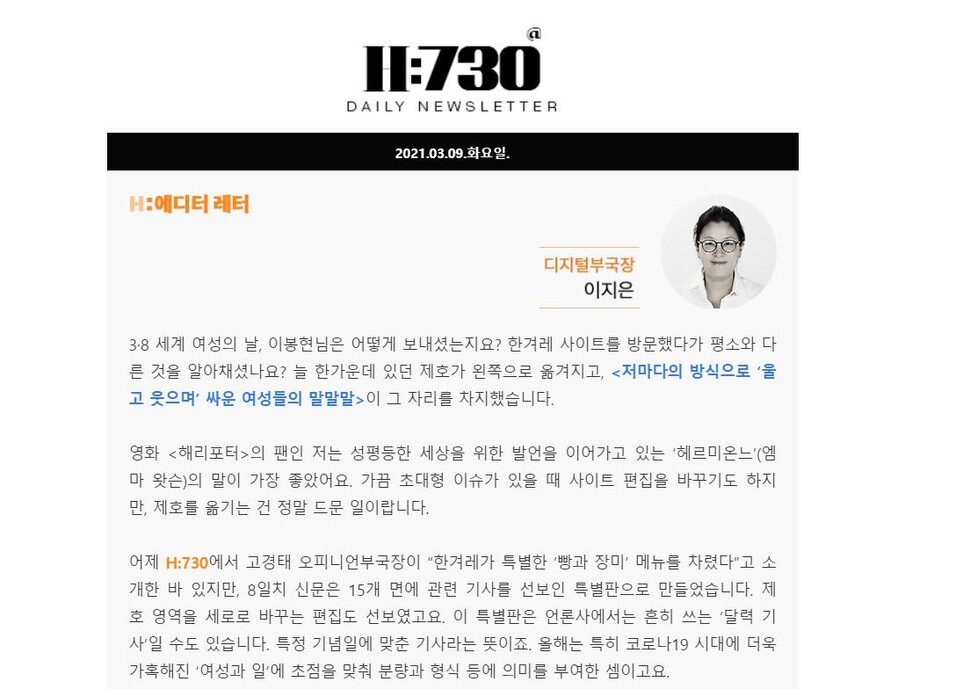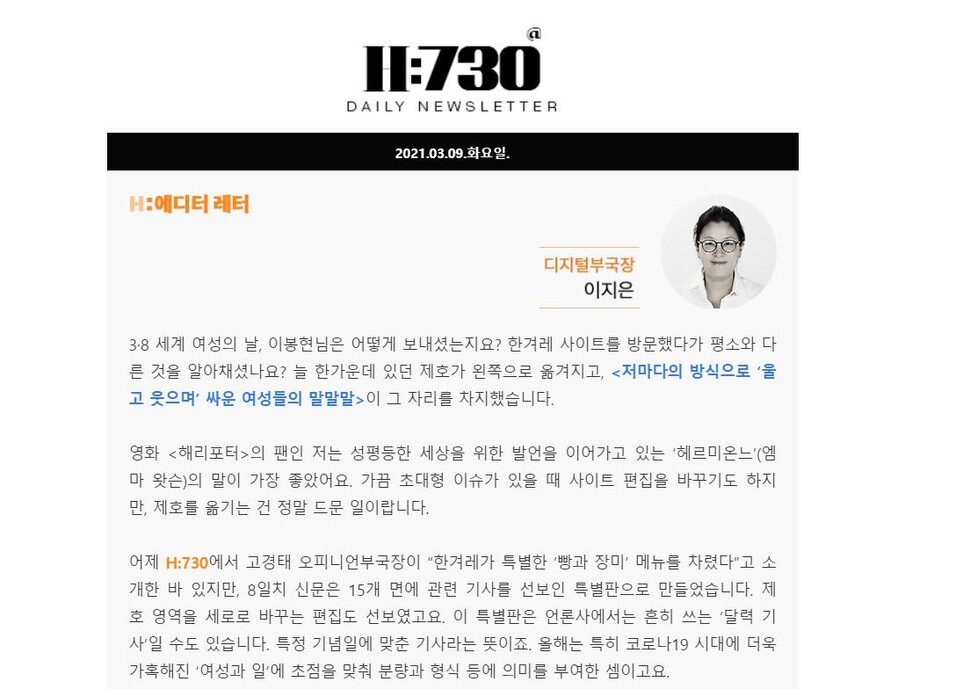이봉현 ㅣ 저널리즘책무실장 (언론학 박사)
요즘 아침마다 뉴스레터가 말을 건다.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한다. 포털에 흩뿌려진 뉴스를 찾아 읽을 때와 달리 잘 편집된 화면이 편안하다. <한겨레>가 올 1, 2월에 하나씩 선보인 이메일 뉴스레터 <휘클리>(h_weekly)와 (에이치칠삼공) 이야기다. 주간인 휘클리는 매주 목요일 정오에 발행되고, 일간 H:730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30분에 독자를 찾아간다.
이 둘은 겨냥하는 독자층과 서비스 모양새가 좀 다르다. 휘클리는 취업을 앞두고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20대 초·중반부터 팀장급 이하의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 기자를 통해 현안을 풀어주는 ‘한 번 물어봤다’, 한 주의 핵심 이슈 세 가지를 쏙쏙 들어오게 정리하는 ‘#뉴스태그’, 화제의 인물에 돋보기를 대는 ‘인싸연구반’, 주말에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하는 ‘책_잡히다’ 등의 코너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누구와 대화해도 주눅 들지 않을 내용의 뉴스레터”를 지향한다고 한다. 제작을 담당하는 ‘팀 휘클리’의 1호, 2호 기자는 독자를 ‘휘클러’로 호칭하며, 반말 투로 친근하게 말을 건넨다.
일간 H:730은 신문 구독자나 홈페이지 방문자 같은 기존 독자에게 품격 있는 뉴스브리핑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속보들 속에서 뉴스의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엄선한 뉴스를 배달한다. 그날의 뉴스정리(H:브리핑)와 함께 사진(H:컷)이나 숫자(H:Number)를 열쇳말로 한 이슈와 관점도 전달한다. 긴 호흡의 심층·르포기사(H:런치타임)도 곁들여진다. 뉴스레터 들머리에 편집국의 부국장들이 손편지 같은 글을 건네며 독자에게 다가간다.
이들 뉴스레터는 뉴스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 읽는 이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 휘클리의 ‘한 번 물어봤다’ 코너가 대표적인데, 독자가 궁금해함직한 뉴스거리가 생기면 1호와 2호 기자가 현장 기자에게 전화를 건다. 이렇게 현안에 정통한 기자를 취재해 사안의 맥락, 뒷얘기 등을 들려주는데, 퇴근 뒤 맥주 한잔 놓고 이야기하듯 글을 풀어간다. 4일 발간된 최근호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취재해온 정치부의 두 기자에게 각 후보 진영의 사정이나 전략을 캐물었다. 그러고 보면 사회 곳곳에 촉수를 대고 있는 편집국 250여명의 기자는 한겨레 뉴스레터의 이야기 창고인 셈이다. 박현철 콘텐츠기획팀장은 “정형화된 기사에는 담지 못한 이야깃거리를 가진 기자가 참 많은 데 놀랐다”며 “뉴스레터가 이들의 이야기를 받아내는 그릇이 된다면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레터의 쓰임새는 3~4년 만에 크게 달라졌다. 종전 언론사 뉴스레터는 스팸메일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뉴스 스타트업이나 개인의 뉴스레터가 성공하면서 보는 눈이 달라졌다. 언론사도 독자를 명확히 하고, 친근한 형식과 내용으로 뉴스레터를 구성하면서 구독자가 늘고 열어보는 비율(개봉률)도 높아졌다. 지금은 주제별로 10~15종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언론사도 있다.
사실, 해외 언론은 일찍부터 뉴스레터의 잠재력을 알아차렸다. 20·30대 여성을 겨냥해 2012년 창립한 미국의 <더 스킴>은 700만명 이상의 뉴스레터 구독자를 확보했다. <뉴욕 타임스>는 분야별로 70여종의 뉴스레터를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뉴닉> <어피티> 등 젊은층을 표적으로 한 신생 매체의 뉴스레터가 창립 2년여 만에 수십만~수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한겨레는 두 종류의 뉴스레터를 발행하지만 좀 더 세분화·전문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 별도의 취재 단위를 두고 있는 ‘기후변화’ ‘젠더’ ‘애니멀피플’(동물) 같은 팀은 독자층이 뚜렷해 뉴스레터가 잘 어울린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 하루와 한 주를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뉴스레터. 정갈하게 차려진 ‘뉴스의 식탁’을 기대하는 독자라면 한겨레 누리집에서 휘클리와 H:730을 구독하고, 주위에 입소문도 내주길 부탁드린다.
▷
데일리 H:730 구독하기
▷
위클리 h_weekly 구독하기
b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