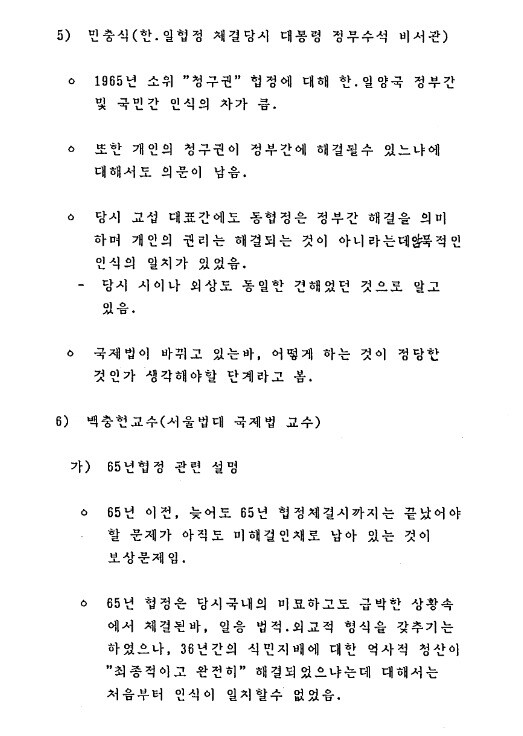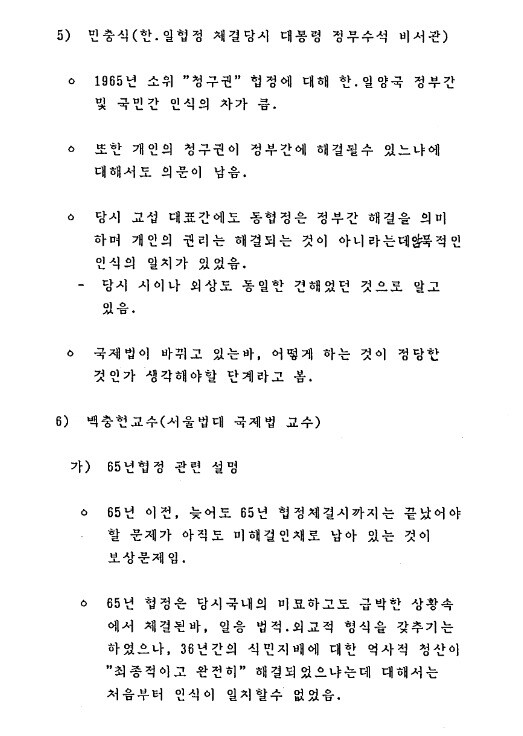6일 외교부가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일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증언이 비밀해제된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6일 외교부가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1991년 8월3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포럼이 열렸는데 이 행사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씨가 참석했다. 이 포럼은 일본 전후처리 과정의 문제를 되돌아보기 위해 한국 강제동원·원폭 피해자를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일본 정부에 의한 전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주일대사관이 정리한 민씨의 당시 포럼 발언을 보면, “1965년 소위 ‘청구권’ 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컸다”며 “또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동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며 “당시 시이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와 재일동포 전문가인 다나카 히로시 교수도 포럼에서 “일본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보상문제가 정부 간에 해결됐으므로 모두 종결됐다는 입장이나, 시베리아 억류 일본인 유족들이 소련 정부를 향해 보상 문제를 제기한 것엔 입장을 달리하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 배상·보상이 포기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간 배보상이 포기된 것이니 개인의 권리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