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지난달 13일 끝났지만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은 끝날 수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한겨레>는 COP26 현장에서 한국 정부 차석대표를 맡아 개막부터 폐막까지 COP26 협상을 이끈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를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외교부에서 세계무역기구과장, 기후변화환경과장,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참사관 등을 지낸 김 대사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을 포함해 2007년부터 6번 이상의 COP를 참가한 기후변화 다자협력 분야 전문가다. 그는 COP26이 폐막하면서 공개된 선언문을 두고 “영국과 미국이 전세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산물”이라며 내년까지 엔디시(NDC,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한국은 다시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종선언문이 막판 후퇴하게 된 뒷얘기도 보태줬다.
“탄소중립 선언한 한국 대표라 당당하게 임했다”
19박20일의 출장을 마친 뒤 서울에서 본 김 대사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던 COP26에서 한국 정부 대표로서 당당하게 임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김 대사는 “탄소중립 선언, 엔디시 상향,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 중단 등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의장국인 영국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됐다”며 “글래스고에서 자신있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일련의 한국 대응에 영국 정부가 고마워했다는 설명이다.
유엔은 COP26를 폐막하며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내년까지 각 국가가 추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상향한 엔디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에 따른 엔디시 목표를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내년 중 추가 상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대사는 덧붙였다.
지난달 1일 COP26 정상세션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 AP/연합뉴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세계의 관심이 적었다는 지적에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중국, 인도, 러시아, 호주, 미국, 유럽연합 등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 영·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감축 목표 이행 보고서를 2년 마다 내야”
특히 이번 COP26에서 한국이 중요하게 여겼던 협상은 2015년 21차 총회 당시 파리협정을 통해 논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의 세부 이행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김 대사는 언론이 주목한 6조 해외감축 기준뿐 아니라 13조 이행보고서 작성 등 투명성 부분에 전세계가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각국은 13조를 통해, 2030년까지 2년마다 실제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기록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김 대사는 “2024년 말까지 첫 번째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그 보고서 항목이 매우 상세하다. 파리협정 때까지만해도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잘하자’였다면 이제부터는 보고서를 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국가 자율 사항이고 제출하지 않았다 해 제재가 가해지진 않는다.
이번 COP26에서 한국 정부는 주요 경제국 경우 2030년대 탈석탄을 하기로 한 성명에 서약해놓고 “시점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사후 입장을 내놓으며 국내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아는 게 없다”고 했다. “의장국인 영국은 세계 제1의 선진국 중 하나다. 모국어인 영어를 활용해 민간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이 이번 총회의 특징”이라며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협상단이 다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의장국이 중요…한국, COP28보다 준비 잘 해 COP33을”
COP를 수차례 경험한 그에게도 이번 COP가 유독 특별한 이유로 김 대사는 총회 성과를 결정짓는 의장국이자 기후선진국인 영국의 역할을 꼽았다. 폐막일 전후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진전된 선언문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영국의 알록 샤마 COP26 의장이 울컥한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알록 샤마 의장은 폐회를 앞두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 한국·스위스·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환경건전성그룹(EIG), 작은섬나라국가들(SIDS) 등을 일일이 만나 문구를 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 영연방국가 인도의 반대로 석탄 퇴출(“phase out”)이 아닌 석탄 감축(“phase down”)으로 문구가 조정됐다.
영국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이 지난달 13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당시 회의장에 있던 김 대사는 폐막을 앞 두고 사흘 동안 6시간 잤다는 알록 샤마 의장의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이라며 협상 뒷이야기도 풀었다. 김 대사는 “영국 심기가 안좋다는 말이 들렸다. EIG 그룹 대표였던 스위스는 개도국이 감축해야 선진국들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당시 인도가 석탄 퇴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선언문 문구가 후퇴하게 되자 유럽연합 쪽에서 알록 샤마 의장에게 ‘이런 상황을 의장국이 알고 있었다면 다른 국가에게 알려줬어야 했다’며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삼기도 했다며 폐막 전 험악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석탄 감축’ 수준으로 후퇴하긴 했지만 합의된 선언문을 내놓을 수 있었던 뒷배경에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가 “석탄 감축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퇴출하게 된다”며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2023년 COP28 유치 의사를 철회하고 2028년 COP33 유치를 희망하는 한국의 과제가 적지 않다고 김 대사는 지적했다. 김 대사는 “COP는 국제회의 이상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달라질 것을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도 변하는 계기를 삼는 의지를 가진 국가가 의장국을 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서 확고한 모습을 보인 뒤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글래스고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이 잘 보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대사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엔디시(2018년 온실가스의 40%를 감축하는 목표) 소개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또 워낙 많은 인원이 모인 COP26이라 정부마저도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했고 민간 중심의 선언들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애초 2만명이 예상됐던 COP26에 실제 참여한 인원은 4만명이었다. 행사장 앞 고급 호텔은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정부대표단이 이미 예약을 완료해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걷기에는 다소 먼 거리의 인근 호텔을 빌려 묵었다. 회의가 계속 이어져서 총회 행사장을 벗어날 수 없어 내부에서만 음식을 조달해 먹은 것은 달갑지 못한 기억이다.
행사장 안팎의 기후활동가들에게 각국 정부대표단은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이 COP26을 두고 ‘말잔치’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김 대사는 “그들 입장에서는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진전되고 있다. 다만 그 변화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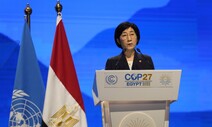


![“내란 처벌 안 하면 다시 총 겨눌 것” 광장 밝힌 시민들 [영상] “내란 처벌 안 하면 다시 총 겨눌 것” 광장 밝힌 시민들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1/391736589175752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