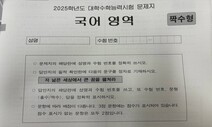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뉴욕타임스>가 지난 5월14일 질 에이브럼슨 편집국장을 교체했다. 편집국장의 65살 정년을 보장하는 뉴욕타임스에서는 예외적인 인사였다. 더구나 그는 162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의 첫 여성 편집국장이었다. 후임 편집국장에 흑인 최초로 딘 베케이를 임명했지만, 세상의 관심은 온통 전임 여성 편집국장에 쏠리는 듯 했다. 많은 언론들은 편집국내 남녀간 임금격차와 같은 남녀차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번 사안을 접근했다. 당시 <뉴요커> 등의 보도를 보면, 에이브럼슨은 자신의 봉급이 전임 남성 편집국장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항의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포브스>나 <가디언> 등도 이 사건을 기점으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에 주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흥미로운 것은 뉴욕타임스의 보도였다. 뉴욕타임스의 미디어 담당 유명 칼럼리스트인 데이비드 카는 “뉴욕타임스에서 에이브럼슨의 퇴장이 긴장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카는 뉴욕타임스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 다큐멘터리인 ‘페이지 원’에서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비중으로 등장한 저널리스트이다. 페이지 원은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뉴스를 고민하고 만드는지를 1년 동안 찍은 다큐다.
그는 자신의 기사에서 “뉴욕타임스의 발행인인 아서 슐츠버거 주니어가 얼마 전까지 퓰리처상 수상을 축하하던 편집국에서 갑자기 에이브럼슨의 교체를 발표한 일은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피 묻은 “왕좌의 게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해당 기사에는 2013년 슐츠버거 발행인이 에이브럼슨과 함께 퓰리처상 수상을 축하하는 장면의 사진까지 덧붙여 있다. 같은 장소에서 슐츠버거 발행인은 신임 편집국장으로 딘 베케이의 임명을 발표한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다른 기사에서도 ‘축출’이나 ‘해고’와 같은 낱말을 사용하면서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자사 발행인이 해고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내부 목소리를 자세히 소개했다.
언론사의 자사보도는 언론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지표와도 같다. 우리 언론들은 자사 소유주나 사장에 대한 보도를 거의 금기시하고 있다. 행사의 인증 사진 정도가 고작이다. 자사 홍보를 위해 지면이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언론사의 내부 갈등은 그들만의 이야기로 제한적으로 소통된다. 이는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인들이 윤리적 차원에서 직장인으로서 회사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정과 맞닿아 있다.
<한국방송>(KBS)의 새 사장 선임에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특별다수제나 사장추천위원회와 같은 쟁점이 한국방송의 텔레비전토론이나 기획보도에서 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이 2012년 <문화방송>(MBC) 노조의 파업으로 해직된 언론인 6명에 대한 복직 판결을 내렸지만, 문화방송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와이티엔>(YTN)의 노조원 해고와 복직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옴부즈만 프로그램에서 제한적으로 다뤘다고 하지만, 이들 문제는 그정도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언론이 스스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취재원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보도의 공정성은 자신의 객관화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언론사 내부 사정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