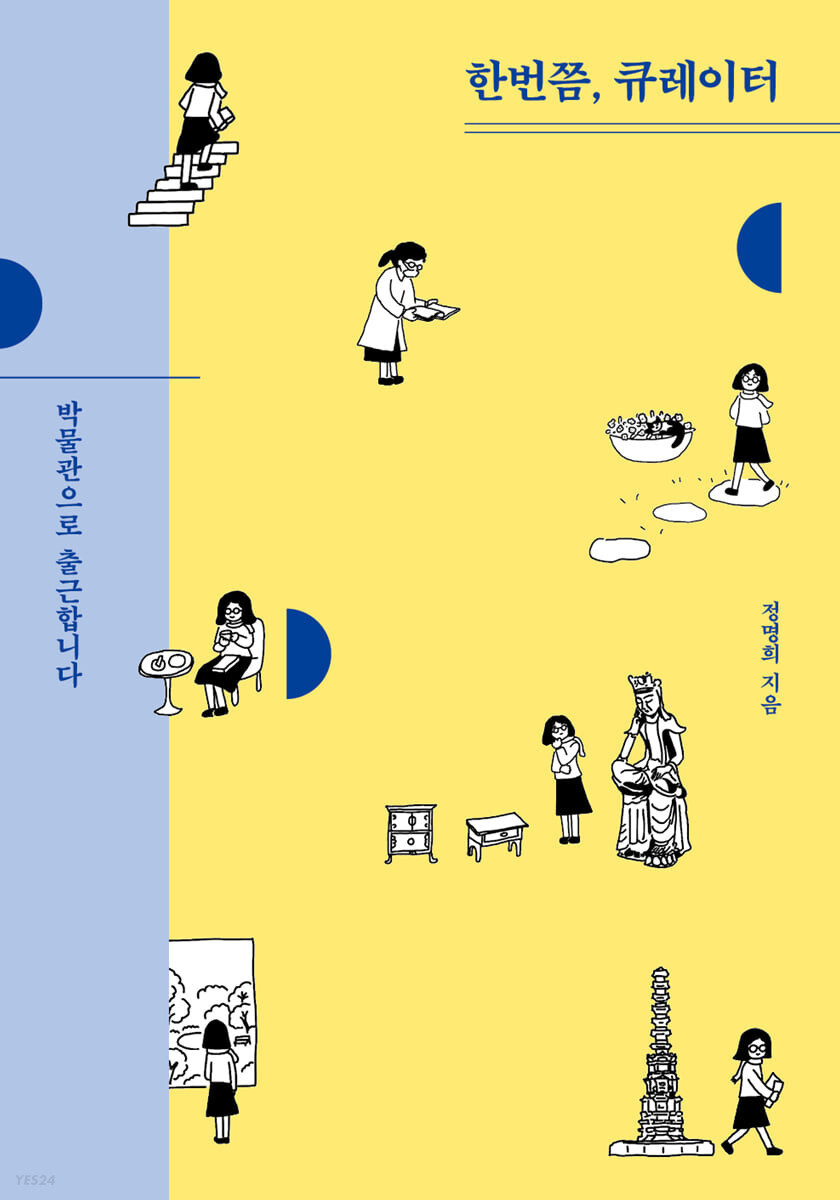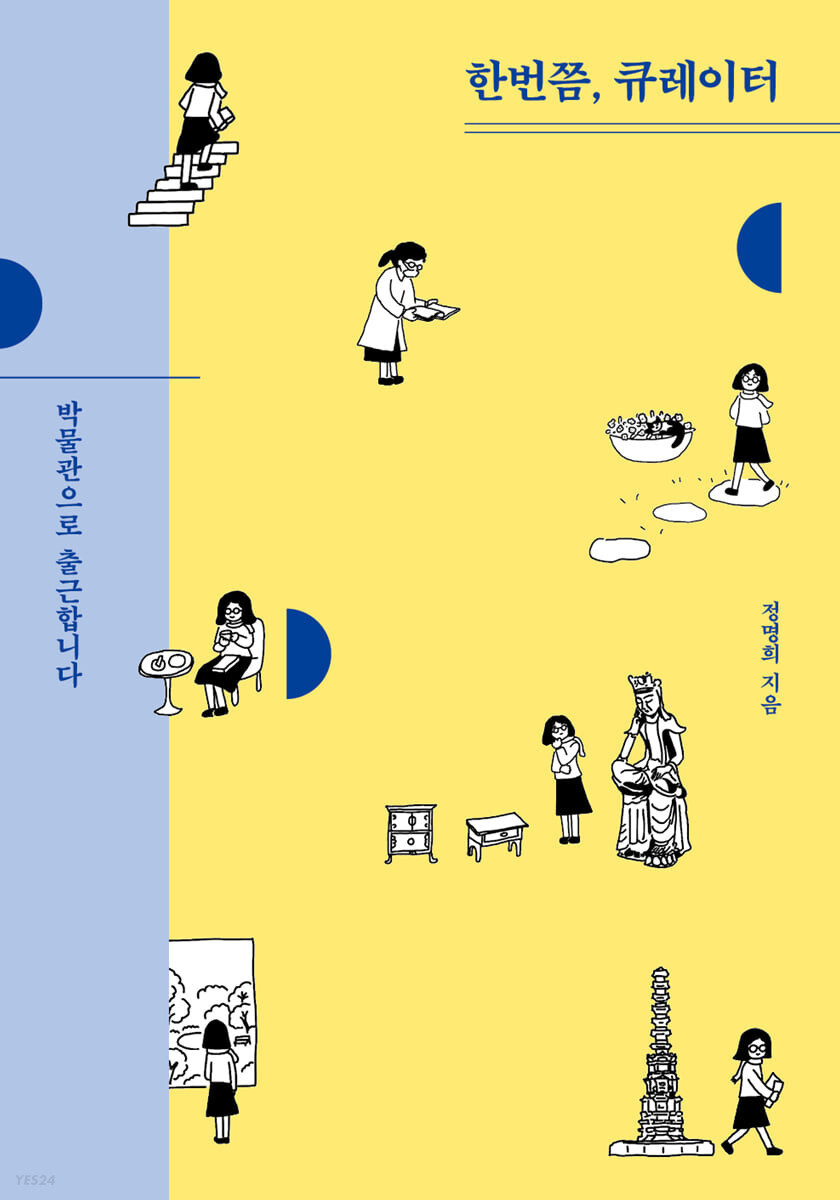간혹 ‘과거’라는 시간대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나간 너무나도 먼 공간처럼 느껴진다. 과거에 머물렀던 사람들, 과거에 남겨진 이야기, 과거에 얽매인 사건 등은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듯한 거리감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질감을 넘어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작은 감동부터, 삶의 철학까지 말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느 한 불특정 다수의 집단을 넘어선, ‘나 자신’이라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한번쯤, 큐레이터’는 평범한 한 사람이 특정 분야에 20년간 종사하며 써내려온 일과 일상의 이야기다. 수백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유물들과 만나고, 그 안에 녹아 있는 이야기를 발굴해 빛나게 만들어주며, 그 유물이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담았다. 단순히 유물들에 대한 서사가 아닌, 국립중앙박물관의 ‘큐레이터’로 맡는 업무는 무엇인지, 전시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열리는지,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저자가 찾은 특별함은 무엇인지 말이다. 때문에 어느 한 유물에 대해 특별한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쓰인 ‘박물관 가이드용’ 책은 아니다. 그러나 지은이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옛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유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색다른 시선으로 써내려간 ‘박물관 초대용’ 책이다.
사람들은 유물이라 하면 그저 깨진 도자기 조각,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 낡아서 금칠이 벗겨진 잔 등을 떠올린다. ‘험난한 몇백년의 세월 동안 깨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도자기’라는 말은 듣기에 대단한데, 그러한 ‘대단함’은 정확히 어디서 오는 것일까. 유물의 희소성? 유물이 견딘 세월? 유물이 과거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전달체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정말 마음속 깊숙이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기에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묵묵한 과거의 공기에만 휩싸여 유물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진 속 멋진 풍경을 기대하고 찾아간 장소가 때때로 우리 기대치를 그대로 재현해주지 못한다. ‘사진 한 장’이라는 공간은 너무 비좁고, 그 풍경의 분위기와 사람 등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처음 도착한 장소에 발을 내디뎠을 때 맞보게 된 기분이 매번 달콤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장소에 도착해 두 눈으로 풍경을 마주하면 사진에서 잘려나가 미처 등장하지 못한 풍경의 특별함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이 석상 위에 뚱하게 앉아 있는 고양이 한 마리라도, 종이와 잉크로 전달되지 못한 푸르른 바람이라도,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볼품 없는 벤치라고 해도 말이다.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직업 중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할 수 있는 ‘큐레이터'라는 일. 궁금하지 않은가? 그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하며,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길래 유물들이 현재에서 빛을 보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과거 유물의 가치는 ‘낡은 것' ‘오래된 것'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저자가 20여년간 성실하게 이어온 자신의 서사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의 이야기를 넘어 유물 세계로 안내하는 가이드처럼 느껴졌다. 그렇기에 더욱 궁금하지 않은가? 수백년 세월을 버틴 유물들이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무엇일지. 박물관에 들르기 전에 유물 세계로의 가이드, ‘한번쯤, 큐레이터’를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오승주 정발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