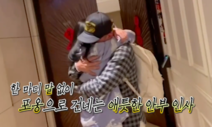시네 플러스+
‘이주민’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을 꾸린 이주민과 마주치는 일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됐죠.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영화에도 이주민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이주민들은 임금을 떼인 노동자나 차별과 멸시를 받는 이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이주민을 다룬 한국영화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건 육상효 감독의 <방가? 방가!>(2010)입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주인공 ‘방태식’(김인권)이 부탄인 ‘방가’로 변신해 취업하면서 겪는 일을 그린 코미디 영화인데, 한국인이 이주민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설정이 좋았습니다.
5년 전 전주국제영화제에 갔다가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 마붑 알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한국영화가 <반두비>, <로니를 찾아서> 등 두 편이나 출품됐는데, 마붑 알엄은 두 영화 모두에 출연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는 그는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 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점을 느끼고는 이주노동자 공동체 활동에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두 영화가 이주노동자를 객체가 아닌, 같은 사람으로 그려서 더욱 좋았다”고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붑 알엄은 2006년 출범한 이주노동자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은 제8회 이주민영화제가 8~10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와 현재를 담은 개막작 <김 알렉스의 식당 안산-타슈켄트>, 이주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이 함께 만든 영화 <친구>, 오사카 조선학교 럭비부의 분투기를 통해 재일동포의 삶을 그린 <60만번의 트라이> 등이 무료 상영됩니다. 이주민과 ‘선주민’(먼저 와서 살고 있는 이들)이 모여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을 활짝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02)776-0416.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