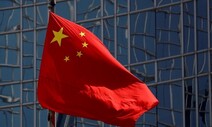14일(현지시각)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르완다 난민 이송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알려진 비행기에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르완다 남서부의 니웅궤 열대우림. 서쪽으로는 키부 호수와 콩고민주공화국, 남쪽으로는 부룬디 국경과 접한다. 아프리카 대륙 복판에서 가장 잘 보존된 열대우림 중 하나다. 침팬지와 원숭이 등 12종의 영장류를 비롯해 숱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숲을 가로지르는 능선은 나일강과 콩고강 사이의 분수령을 형성한다. 키부 호수를 따라 북쪽으로 옮겨가면 비룽가, 멸종위기종인 고릴라들이 사는 곳이다. 아프리카 하면 흔히 떠올리는 밀림이 바로 이런 곳들이다.
유럽에도 ‘정글’이 있다. 영국과 마주 보는 프랑스 도시 칼레. 영국으로 건너가려는 이주민, 난민들이 이곳에 모여든다. 칼레의 밀림이 형성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해협 아래 터널을 이용해, 혹은 페리선을 타고 영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적십자사가 칼레의 상가트라는 곳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다. 이를 시작으로 천막촌이 여기저기 솟아났고 주민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이 이주민들 때문에 폐쇄된 적도 있었다. 인신매매조직에 돈을 주고 냉동컨테이너에 숨어 도버를 건너다 숨진 사람들, 보트를 타고 영국에 다다랐다가 해안경비대에 붙잡힌 사람들…. 프랑스 정부는 천막촌이 커질 때마다 강제철거에 나서지만 곧 다른 곳에 새 정글이 생겨난다.
영국 ‘난민 처리 비용’ 지급 방침
해협 건너 도버는 정글을 거쳐, 혹은 더 멀리 동유럽을 지나는 여러 경로를 타고 몰려든 이주민들의 1차 기착지다. 주로 아프리카·중동 출신이 많지만 지금은 베트남 등 아시아인들의 영국행도 늘고 있다.
곳곳에 위험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국제 밀입국 루트는 말 못할 인권침해의 현장이자 불법적인 ‘인간 거래 산업’이 되고 있다. 난민과 망명신청자와 불법이주자, 혹은 인신매매 피해자. 이런 구분들 사이에 사실 명확한 경계선은 없다.
지난 4월 도버를 방문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불법 이주자를 르완다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에서 6500㎞ 떨어진 르완다에 1억2천만파운드, 약 1800억원 넘는 돈을 주고 이주자들을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르완다 이송 프로그램'의 골자는 영국에 들어온 이들을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르완다에서 영구적인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거기 계속 살거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나라로 재차 망명을 신청하거나 둘 중 하나다.
영국 정부는 르완다에 1억2천만파운드를 선불로 줄 것이고, 더 많은 이를 ‘처리'하면 추가로 더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 정부 안에서조차 “이주자들을 막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이든 아니든, 이주자들은 자기가 태어나 자란 나라를 떠나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돈을 주고 이주자들을 빈국에 떠넘기는 행위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영국 법원은 정부를 편들어줬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14일 망명 신청자 7명을 태우고 르완다로 향하려던 영국 수송기의 이륙을 ‘임시조처’로 중단시켰다. 영국 정부는 반발했다.
영국 내에서의 논란은 ‘르완다가 과연 난민들을 보낼 만한 곳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르완다는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에 둘러싸인 내륙국가다. 수치만 보면 르완다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인구 1320만명 가운데 40% 가까이는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성인 인구 30%는 여전히 글을 못 읽는다.
하지만 한 나라를 수치로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 1인당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100달러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2000년대부터 매년 6~8% 경제가 자라고 있으며 부패도 적은 편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를 보면 1990년 겨우 33.4살이었던 평균기대수명은 2019년 69살로 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성평등 순위’에서 르완다는 북유럽 국가들에 이어 세계 5~7위권에 이름을 올린다. 국회에 여성 의원이 남성보다 많고, 법률적 제도적 평등 수준이 매우 높다.
지난 4월 <비비시>(BBC)는 르완다 르포에서 “일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 녹색이 깔려 있고 깔끔한 나라,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수도 키갈리”를 언급했다. “모두가 세금을 내려 하고, 서비스는 믿을 만하며 도로는 안전하다.” 르완다를 여행했거나 체류한 한국인들도 “르완다는 주변 국가들과는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서구인들은 이 나라를 ‘아프리카의 스위스’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포정치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도 있다. “술집에서 정치적 토론을 하면 누군가가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당국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내전을 진압한 폴 카가메 현 대통령이 2000년부터 장기집권하면서 인권단체와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카가메는 효율적인 주민 동원-감시 체제를 만들었고, 르완다의 빛과 그늘은 모두 그 체제와 연결돼 있다. < 비비시 > 가 전한 바로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무간다’라는 이름의 공동 청소를 한다. 쓰레기는 사라지고 도로는 깨끗해진다. “강제로 시키는 사람은 없지만 당국의 지침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임을 모두가 안다.”
국제규약 무시한 르완다 이송 계획
망명 신청자들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은 난민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다. 유럽국들은 마치 가난한 나라에서 떼밀려 들어온 이들을 자기네가 다 끌어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세계 난민의 85%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다. 르완다도 주변 부룬디나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온 난민 15만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계획대로 이주자와 난민들을 르완다에 떠넘길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영국의 ‘르완다 이송’ 계획은 서구의 이율배반을 여러 측면에서 부각시켰다. 영국의 생각 있는 이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르완다의 인권 상황뿐 아니라 영국 정부의 인권 마인드인지도 모른다. 애초 비행기에 실려 르완다로 떠날 예정이던 몇몇 사람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남성은 기절한 뒤 휠체어에 실려 비행기에 올려졌고, 수갑을 찼거나 밴의 좌석에 손이 묶인 채 공항으로 옮겨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영국 난민정책과 인권 수준의 한 단면이다.
구정은 | 신문기자로 오래 일했고,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 <10년 후 세계사> 등의 책을 냈다.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