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음식 전문가 김현진. 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짬] ‘신들의 향연, 인간의 만찬’ 펴낸 김현진 종교음식 전문가
항생제 알레르기 진단 받고
양계장 직접 확인 뒤 충격 대학원서 불교윤리 전공
신작서 종교와 음식 탐구
“풍성한 만찬, 나눔서 시작” 지난달 21일 한겨레신문사를 찾은 종교음식 전문가인 김현진(45·사진)씨는 “먹방 현상은 음식의 왜곡된 관음증 때문”이라고 정의한다. 그가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이어트를 위해 먹은 음식의 부작용 때문이다. 대학생 때 몸무게가 80㎏까지 불었다. 살을 빼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했다. 여섯달 동안 달리기를 하며 달걀과 닭가슴살을 주로 먹었다. 덕분에 체중은 40㎏으로 줄었고, 혈압 수치도 정상이 됐다. 하지만 눈가에는 가려움증과 각질이 자리잡았고, 우울증과 불면증도 생겼다. 병원에서는 ‘항생제 알레르기’라고 진단했다. 닭고기에 함유된 항생제가 원인이었다. “그동안 먹은 닭이 양계장에서 어떻게 키워지는지가 궁금했어요. 유명 닭고기 양계장을 가봤어요. 충격이었어요.” 사람 입에 들어오기까지 다른 동물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김씨는 대학원에 진학해 불교윤리를 공부했다. 학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살생을 금지한 불교의 계율학을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먼저 그는 불자들이 살생을 금지하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 육식은 피하면서 식물을 죽이는 것은 당연시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살아 있는 것은 죽이면 안 된다는 ‘불살생의 원칙’을 지키려면 생존을 포기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초기 불교에서는 식물도 감각을 지니고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탁발로 식사를 해결한 출가자들은 걸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생에 대해선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출가하지 않은 불교(재가)신도들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공양을 통해 자신의 죄가 덜해지기만을 기원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숲에서 독립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한 승려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 이후에야 승려들은 식물을 먹는 게 해탈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채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다고 한다. 그럼 왜 불교 음식에서는 오신채를 금할까? 김씨는 “자극이 강한 파, 마늘, 부추, 달래, 홍거 등 다섯가지 채소를 금지하는 전통은 이들 채소가 인간에게 음란한 생각을 일으키고, 탐(貪·욕심), 진(嗔·분노), 치(癡·어리석음)를 일으킨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애초 오신채를 먹으면 신선이 못 된다는 도교의 전통이 불교에 흡수됐다고 김씨는 설명한다. 붓다는 파와 마늘만 금지했고, 그 이유도 고온다습한 인도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 심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이나 일본 불교와는 달리 한국 불교에서 아직도 사찰음식에서 오신채 금지 전통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찰음식이 수행이나 공부를 하는 공동체에 최적화된 음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김씨는 말한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마시는 과정 자체가 수행의 일부로 녹아 있는 것이 사찰음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른 생명을 죽이는 역설적인 행위이죠. 종교에서 음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건 결국 사랑이에요. 가난한 자, 없는 자와 나누는 밥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최근 각종 종교와 음식의 연관 관계를 서술한 <신들의 향연, 인간의 만찬>(난달)을 낸 김씨는 “먹방에 좌우되는 음식문화가 아니라 자신만의 레시피와 음식 코드에 따라,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의미있는 식탁을 차려주는 음식문화를 창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나만의 식탁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식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외 계층에겐 먹고 마시는 것이 생존의 문제이자, 기본적인 삶의 과제입니다. 인간의 만찬이 풍성해지는 것은 함께 나눔에서 시작돼요. 강자만 포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날, 우리도 신들의 향연에 함께할 수 있어요.”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연재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영상]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 [영상]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4/53_17386741447432_251738674130643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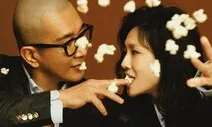
![[영상] 윤석열 ‘의원체포 지시 전화’ 증언 마친 홍장원 “토씨까지 기억” [영상] 윤석열 ‘의원체포 지시 전화’ 증언 마친 홍장원 “토씨까지 기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368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