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도시 경주의 탄생>
“영토확장 과정 전형적 정복형태”
지리학자 관점 문헌연구 반 답사 반
논리 갖춘 파격적 추론 끌어내
“왕도로 시대조명 이미 20년 계획표”
지리학자 관점 문헌연구 반 답사 반
논리 갖춘 파격적 추론 끌어내
“왕도로 시대조명 이미 20년 계획표”
책·인터뷰 / ‘고대도시 경주의 탄생’ 쓴 이기봉 규장각 연구원
“신라는 통일국가가 아니라 정복국가였어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기봉(41) 책임연구원의 말은 충격적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배웠고 그 나라를 ‘통일신라’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다. 그는 후삼국에서 고려로 이행하는 과정은 통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라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정복국가에서 나타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이에요. 무굴제국이나 청나라가 대표적인데, 신라도 똑 같아요.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된 지역과 지역민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그가 근거로 드는 것은 경위제-외위제, 골품제, 화랑도 제도.
왕경인한테만 주어지던 벼슬인 경위는 17개 관등, 지방 유력자한테 주어지던 외위는 10개 관등으로 되어있다. 경위는 모든 관등이 주어진 반면 외위의 가장 높은 악간은 제7관등인 일길찬에 상당했다. 문헌상으로는 그보다 하나 아래인 술간(사찬에 해당)만 나타나는데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촌주나 지방관의 보조자 역할에 그쳤다. 진골-6두품-5두품-4두품으로 된 골품제 역시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화랑도는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그 가운데 진골이 핵심이었다. 정복의 주체였던 왕경인의 후손인 이들은 정복한 땅을 순례하면서 통치자의 자세를 배우고 영토의 특징을 익혔다.
“신라의 영역 확장과정을 보면 정복임이 확연해요. 동심원적인 전염확산 형태를 보이거든요.” 신라의 1차 팽창기(42~147)는 태백산맥 동쪽에 집중돼 있는 반면 2차 팽창기(185~297)는 태백산맥을 넘어 동북방향으로 뻗어나간다. 당시는 소국이 분립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신라가 그들과 연합을 추구했다면 전염확산 아닌 다른 형태의 확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사논문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낸 <고대도시 경주의 탄생>(푸른역사)에는 이러한 파격적인 추론들로 가득하다. 추론이라고 해서 단순논리가 아니라 문헌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얻어낸 것들이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학의 변방에서 접근했기 때문. 지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했다. 그에게 지리학은 목표가 아니라 관점이었다. 답사가 몸에 배었다는 그는 논문을 쓰면서 한달에 걸쳐 경상도를 샅샅이 훑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답사가 능사는 아니었다. 문헌연구가 탄탄할 때 답사가 의미있다는 것. 굳이 말하자면 문헌반 답사반. 그는 새로운 문헌해석은 5%에 있다고 말했다.
 출발점은 삼국사기 권34 지리조에 나오는 구절, ‘今按 新羅始祖赫居世 前漢五鳳元年 甲子 開國 王都長3千75步 廣3千18步 35里 6部’다. 그 중 왕경의 크기를 말하는 ‘王都長3千75步 廣3千18步 35里 6部’를 달리 읽었다.
‘왕도는 길이가 3075보, 너비가 3018보인데 (그 안에) 35리와 6부가 있다’라는 기존 해석을 버렸다. ‘(그 나라의 범위에는 첫째) 왕도가 있었다. (왕도의 규모는) 길이가 3075보이고, 너비가 3018보이며, (그 안에는) 35리가 있었다. (둘째) 6부가 있었다.’ 그가 5% 새롭게 읽은 문장이다.
여기에서 왕경의 형성과 성격변화로 나아가고, 6부는 6촌의 위치비정으로 확산됐다. 그의 기민함은 영일냉수리비와 울진봉평비에 등장하는 인물의 부별 분포를 전혀 새롭게 보는데서도 드러난다. 수적으로 양부와 사량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대부분 연구자들은 두 부가 나머지 네 부보다 사회·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그는 6세기 초에 도시가 형성돼 있었고 지배층이 살았던 도시가 양부와 사량부에 걸쳐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3~4년 단위로 연구계획이 60살까지 짜여있어요.” 경주를 시작으로 후삼국, 고려, 조선의 수도를 통해 시대별 국가의 흥망을 꿰고 이를 중국과 일본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학문 간의 벽을 깨버린 그는 이제 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훨훨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눈빛이 무척 맑다.
글 임종업 선임기자 blitz@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출발점은 삼국사기 권34 지리조에 나오는 구절, ‘今按 新羅始祖赫居世 前漢五鳳元年 甲子 開國 王都長3千75步 廣3千18步 35里 6部’다. 그 중 왕경의 크기를 말하는 ‘王都長3千75步 廣3千18步 35里 6部’를 달리 읽었다.
‘왕도는 길이가 3075보, 너비가 3018보인데 (그 안에) 35리와 6부가 있다’라는 기존 해석을 버렸다. ‘(그 나라의 범위에는 첫째) 왕도가 있었다. (왕도의 규모는) 길이가 3075보이고, 너비가 3018보이며, (그 안에는) 35리가 있었다. (둘째) 6부가 있었다.’ 그가 5% 새롭게 읽은 문장이다.
여기에서 왕경의 형성과 성격변화로 나아가고, 6부는 6촌의 위치비정으로 확산됐다. 그의 기민함은 영일냉수리비와 울진봉평비에 등장하는 인물의 부별 분포를 전혀 새롭게 보는데서도 드러난다. 수적으로 양부와 사량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대부분 연구자들은 두 부가 나머지 네 부보다 사회·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그는 6세기 초에 도시가 형성돼 있었고 지배층이 살았던 도시가 양부와 사량부에 걸쳐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3~4년 단위로 연구계획이 60살까지 짜여있어요.” 경주를 시작으로 후삼국, 고려, 조선의 수도를 통해 시대별 국가의 흥망을 꿰고 이를 중국과 일본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학문 간의 벽을 깨버린 그는 이제 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훨훨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눈빛이 무척 맑다.
글 임종업 선임기자 blitz@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고대도시 경주의 탄생’ 쓴 이기봉 규장각 연구원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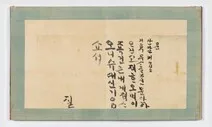
![[꽁트] 마지막 변신 [꽁트] 마지막 변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6/20250126502223.webp)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3/20250123504340.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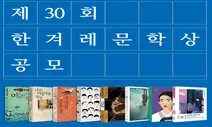
![차기작 회의… 갑자기 어디서 한기가… [.txt] 차기작 회의… 갑자기 어디서 한기가…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3/2025012350436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