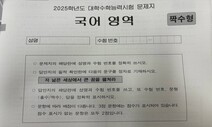충북 음성 꽃동네를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16일 오후 ‘희망의 집’에서 평생 병상에 누워 있는 오미현(23)씨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음성/사진공동취재단
25평 방에 2층 침대 24개 다닥다닥
‘3개월 적응기간’ 면회·전화 금지
일부 장애인단체, 교황 방문 반대
정부 지원 부실해 자립도 어려워
“지역사회 중심 정책 필요” 지적도
‘3개월 적응기간’ 면회·전화 금지
일부 장애인단체, 교황 방문 반대
정부 지원 부실해 자립도 어려워
“지역사회 중심 정책 필요” 지적도
권오준(42)씨는 경기 가평 꽃동네에서 10년을 살았다. 1996년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친 권씨는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여동생의 권유로 꽃동네라는 이름의 시설에 ‘입소’했다. 입소 뒤 권씨는 2층 침대 24개가 다닥다닥 붙은 82㎡(25평) 남짓한 크기의 방에서 거의 누워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었다. 아침 식사는 새벽 5시30분, 점심은 낮 12시30분, 저녁은 오후 4시30분이었다. 야식은 따로 없었다. 마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꽃동네를 찾아올 때만 물건을 살 수 있었다. 권씨는 2011년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꽃동네 밖으로 나왔다. 권씨는 “말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시설을 나오게 됐다”고 했다.
꽃동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 가운데 유일하게 ‘논란’이 된 곳이다. 1976년 세워진 꽃동네에는 장애인, 노인 환자 등 5000여명이 지내고 있다. 지난 16일 이곳을 방문한 교황이 입소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수용과 보호’가 아닌 ‘탈시설을 통한 자활’이라는 장애인 인권 흐름에 역행하는 대규모 수용시설 방문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꽃동네로 대표되는 장애인 수용시설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정책의 한 축을 이뤄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은 3만1152명이다. 미등록 시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그러나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자립 불가능’을 전제로 한 수용시설 자체에 매우 부정적이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시설 근무자들조차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장애인단체들은 말한다.
이 때문에 시설에서 ‘탈출’을 했다는 이들은 많다. 1999년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조성미(33)씨도 꽃동네에 들어갔다. 생활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적응기간’이라는 이유로 석 달 동안 외출도, 면회도, 심지어 공중전화 사용도 금지됐다. 적응기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50㎡(15평) 남짓한 방에서 13명이 거의 누워서만 지냈다. 그는 먼저 시설에서 나간 사람의 소개로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알게 됐고, 이곳의 도움으로 8년 만에 꽃동네에서 나왔다. 조씨는 현재 자립생활가정에서 살고 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으며 자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탈시설과 자활을 하기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수준은 열악하기만 하다. 장애인 자립에 가장 중요한 주거 지원과 초기 정착금 지원은 부실한 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활체험홈은 전국에 197곳, 공동생활가정은 685곳에 불과하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은 2766명 수준이다.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은 36만4507명인데, 이 가운데 실제 활동지원을 받은 이는 6만435명(16%)뿐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20일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이 아직도 장애인 시설 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통합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홈 등 소규모 시설에 더 많은 예산을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자립보다는 보호 위주로 정책이 짜여 있다. 자립을 하려 해도 오히려 중증장애인이어야만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시설에서도 ‘그 몸으로 어떻게 생활할 거냐’며 탈시설을 말리는 일이 되풀이된다. 시설에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